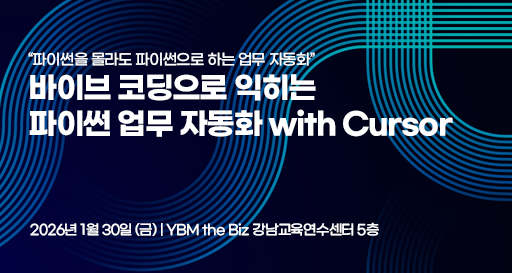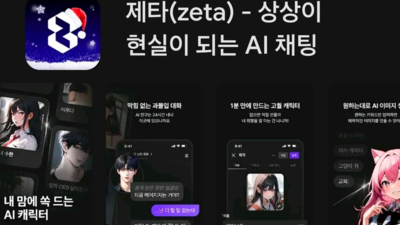스필버그의 SF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나오는 자동차는 날아다닌다. 베란다에 떠 주차하는 장면도 나온다.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시간적 배경은 2054년이다.

이 영화 속에는 이외에도 e페이퍼와 3D 디스플레이,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등 그럴듯해 보이는 다양한 기술들이 구현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내놓고 미래과학창조부와 한국과학기술정부연구원이 편역한 `2040년의 과학기술`에 따르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전망했다.
운전자가 말만 하면 알아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SF영화 `토탈리콜`에 나오는 자율주행 자동차 구현은 오는 2040년이면 실현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가 2040년에 실현될 것으로 정리한 `풍요로운 세상`의 단면이다.
하지만 날아다니는 자동차 대중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수직 이착륙 기술이 확보돼야 할 뿐만 아니라 연료 효율, 항공 트래픽 제어, 활주로, 주차장 확보 조건 등을 모두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가능하더라도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호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 교수가 설계한 미래형 자동차인 `i-CAR` 개념에 따르면 컴퓨터와 통신 기능이 주된 기능이 될 것으로 봤다. 네바퀴는 단지 운송을 위한 기본 보조수단에 불과하다는 시각이다. 자동차의 주된 핵심 고부가가치 부품은 반도체와 자동차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SW가 된다.
2040년이 되기 전 미래자동차 안에 들어갈 부품 자체 통신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모든 센서나 제어기, 액추에이터, 컴퓨터, 멀티미디어 부품 등이 네트워크로 연결된다. 차내 무선통신뿐 아니라 차량 외 네트워크와도 무선 통신으로 연결된다. 차내 배선은 단순화되고 결과적으로 차량이 경량화된다.
나아가 인터넷 인프라와 차량내의 정보도 공유되게 돼 수많은 새로운 스마트 디지털 서비스가 창출되는 `보고`가 바로 자동차라는 것이다.
국내 미래형 자동차 기술 개발 수준은 걸음마 단계다. 기초 및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정부와 한국연구재단 등이 예산투자 등을 통해 공을 들이고 있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
특히 1인용 전자 자동차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나 SW에 대한 기술 확보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전자 부품이나 반도체, SW에 대한 안정성 확보 기술, 네트워크 보안 기술은 초보 단계다.
현재 구글이나 스탠포드, 도요타, 국내에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자동차처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미래형 항공기 개발 로드맵을 발표했다.
KAIST를 위시한 고려대, 성균관대, 아주대, 건국대, 부산대, 울산대, 인하대 등이 차세대 스마트 자동차나 차량용 배터리, 초전도 전기추진체, 연료전지 등을 개발 중이다.
[인터뷰] 김정호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 교수
“2040년 미래자동차는 `디지털 전자자동차`가 될 것입니다. 스마트폰에 바퀴와 핸들이 달린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국내 최고 자동차 전자파 및 무선전력전송 전문가 김정호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 교수는 “미래차는 현재의 스마트폰에서 누리고 있는 기능 및 서비스가 그대로 자동차에 안에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앞으로 국내 자동차 회사들은 시장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차량용 반도체와 SW 개발 투자, 인력확보에 매진해야 한다”며 “2040년이 되면 전자공학, 전산공학 전공자들의 최고 직장은 자동차 회사가 될 것”으로 봤다.
그때가 되면 차량도 현재의 스마트폰 시장처럼, 네트워크 기업의 보조금으로 사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 김 교수의 예측이다. 차량의 가격은 차량 앱을 다운로드 받는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추후 네트워크 사용 요금으로 갚게 되는 새로운 시장 질서가 형성될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자동차 회사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서비스는 네트워크 회사가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의 스마트폰 시장 구도와 제조업체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