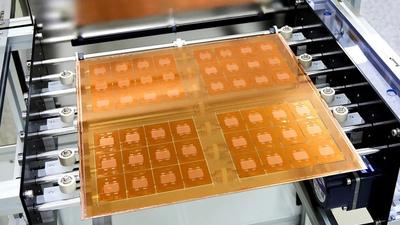미국 버클리대 헨리 체스브로 교수가 2003년 제시한 개념이다. 모든 산업계에 통용된다. 개방형 혁신으로 풀이되는 오픈 이노베이션은 연구개발 전 과정을 한 기업이 독자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진단에서 출발한다. 갈수록 커지는 연구개발 비용을 혼자 감당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크다. 특히 업종과 기술을 망라한 융합이 가속화된 21세기에는 `독불장군`이 설 자리가 더 이상 없다.
애플이 아이폰과 앱스토어를 통해 수많은 외부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을 끌어안은 것은 대표적인 오픈 이노베이션이다. 이에 반해 독자 운용체계(OS)인 심비안의 덫에 걸린 노키아가 폐쇄적인 연구개발에 몰두하다 스마트폰 시대의 패권을 내준 것도 결국은 오픈 이노베이션에서 실패한 탓이다.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은 자동차 업계에도 활발하다. 토요타와 BMW가 차세대 친환경차 연구개발에서 손을 잡은 것이 대표적이다. 두 업체는 기존 완성차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한다. 하지만 차세대 연료전지(FC) 자동차 연구개발에서 적과의 동침도 불사했다. 2020년까지 두 업체는 차량 경량화 기술 및 친환경차 개발에서 협력한다. 두 업체의 연구개발 자원은 자연스레 융합돼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다. 이들의 차세대 차동차 시장 주도권도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스마트카 시대에도 오픈 이노베이션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반도체를 비롯한 부품부터 SW, 통신 등 연관 산업과의 융합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현대·기아차 고위 관계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스마트카 기술 혁신을 (완성차 업체) 혼자 감당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고 지적한 것도 일맥상통한다. 스마트카 시장 주도권을 노리는 현대·기아차도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에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다. 해답은 멀리 있지 않다. 산·학·연·관을 망라한 국내 스마트카 산업 생태계와 상생하려는 노력이 그 출발점이다.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