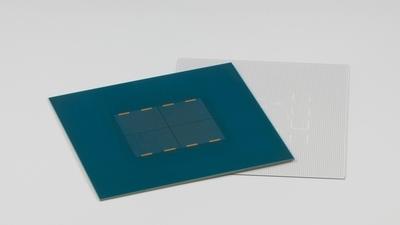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LNG 도입계약 현황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LNG 도입계약 현황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천연가스(LNG) 장기도입계약을 서두른 것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가스업계는 안정적인 공급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공기업이기 때문이라는 의견과 LNG 경쟁체제 도입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공사의 전략이라며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가스공사는 2010년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난 LNG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맞서고 있다.
6일 가스업계와 가스공사에 따르면 2010년 12월에서 2012년 2월까지 1년 3개월 사이 가스공사는 호주,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총 1184만톤의 LNG 장기도입계약을 체결했다. 이 물량은 2012년 가스공사 LNG 판매량 3600만톤 기준 약 30%에 해당하는 양이다.
장기도입계약을 시작한 1993년부터 2007년까지 1년에 1건 이상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던 가스공사가 이 시기에 집중 계약했다.
가스업계는 가스공사가 장기도입계약을 갑자기 서두른 이유를 정부의 천연가스수급 계획에서 국내 수요예측에 실패해 수급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러시아 PNG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LNG에 대한 수요예측을 현실과 동떨어지게 낮게 잡았고, 가스공사는 장기 LNG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2008∼2009년에 장기도입계약을 맺지 않았다.
하지만 2010년 국내 LNG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LNG가격은 유가 100달러 기준 MMBtu(가스용량 단위) 15∼16달러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신규 LNG 프로젝트 추진도 경제위기로 지연돼 수급 위기상황에 처했다. 공급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가스공사는 2010∼2012년 초 조기물량(계약 후 1∼2년 내 도입 조건)을 포함한 패키지로 많은 계약을 진행했다.
문제는 가스공사가 장기공급계약을 몰아서 한 시점이 북미 셰일가스 생산이 시작된 시점이라는 것이다. 셰일가스 영향에 앞으로 LNG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싼값에 LNG를 도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도 장기도입계약에 묶여 그 혜택을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가스공사가 수급에 급급한 나머지 가격이 저렴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도입계약을 잇달아 체결, 향후 셰일가스 공급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또한 가스공사가 민간 가스업체들의 시장 참여를 견제하기 위해 장기도입계약을 서둘렀다는 주장도 있다. 민간업체들은 신규 발전소 수요 이외에는 2024년께 카타르·오만 등과 장기도입계약이 끝나는 시점에나 참여를 생각할 수 있다.
가스업계 관계자는 “가스공사는 민간업체들의 경쟁도입을 경계하며 필요한 물량이 많아지는 경우 민간업체들이 끼어들 여지가 생길 것을 우려했다”며 “민간업체 참여의지를 꺾기 위해 도입가격전망은 뒷전으로 미룬 채 장기도입계약을 서두른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관계자는 “안정적인 LNG 공급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2년마다 천연가스수급 계획을 세우지만 항상 예상보다 수요가 많았고, 지금도 2017년에는 LNG도입 물량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