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구글이 공개한 정부의 데이터 요청 건수 추이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구글이 공개한 정부의 데이터 요청 건수 추이 구글·트위터 등 미국 주요 인터넷 기업들이 `데이터 보호의 날(Data Privacy Day)`을 맞아 정부로부터 이용자들의 사생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법 개정을 관철시키기 위해 공동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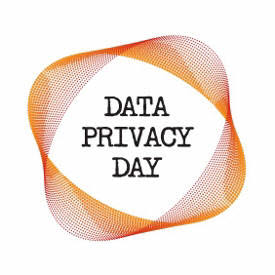
데이비드 드럼몬드 구글 최고법적책임자(CLO·부사장)는 28일(현지시각) 구글 블로그에서 “대형 IT 기업들과 연합해 1986년 제정됐던 `전자통신개인정보보호법(ECPA)`을 개정하도록 미국 의회에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드럼몬드 부사장은 정부의 이용자 데이터 제공 요구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지난해 미국 정부로부터 총 1만6407건의 이용자 데이터 제공 요청을 받았다. 매월 평균 1400여건이다. 이메일·문서 등에 관한 것으로 이용자 3만1072명에 해당하는 요구다. 이 중 절반은 소환장을 통해 이뤄졌다.
트위터도 동참했다. 트위터는 이날 두 번째 투명성 보고서를 내놓고 세부 정보를 공개했다.
트위터는 지난해 각 국 정부로부터 1858건의 이용자 데이터 제공 요청을 받았다. 또 48개의 삭제 요청과 6646건의 저작권표시 요청도 있었다. 전체 요청의 81%가 미국 정부기관에 의한 것으로 사법기관(60%), 수색영장(19%), 법원명령(11%) 등의 순이었다.
트위터는 미국 정부 요청에는 69%, 다른 국가들의 요청에는 57%만 응했다고 밝혔다. 법원 명령으로 금지되는 20%를 제외하고는 정부의 요청 상황을 이용자들에게 통보한다고 덧붙였다.
트위터는 “우리는 정부의 이용자 데이터 요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그러나 정부의 요구가 증가할수록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글, 트위터뿐 아니라 MS, 야후 등 IT 기업들도 정부로부터 이용자 데이터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하고 있다. ECPA 제정 당시에는 이용자의 이메일과 메시지 등에 대한 정부의 조사가 필요하지 않았지만 관련 법적 분쟁이 늘면서 정부의 요청도 급속하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정부의 요청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테두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구글은 “수색 영장도 없이 이용자의 데이터를 얻으려는 것을 막아야한다”면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문서를 빼내는 것은 이용자 책상에서 종이 문서를 꺼내는 것과 같은 법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회에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패트릭 레히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안을 제출했다.
외신들은 이같은 움직임은 경찰과 FBI 등의 업무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