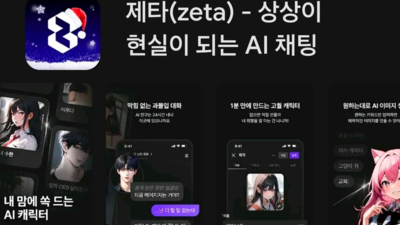우리나라 플랜트 산업은 지난해 세계 경기 침체에도 648억달러 규모 수주를 기록했다. 수주액으로 따지면 조선·자동차·반도체를 추월해 우리나라 기간산업의 큰 축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성장 비결은 빠른 속도와 뛰어난 시공품질이다. `빨리빨리` 근성, 도전적이면서 유연한 민족성, 조직 우선 문화 등 한국 특유의 기질에 기인한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최근 플랜트 산업을 놓고 성장률 저하와 핵심 역량 해외 의존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속도와 품질만으로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해외 선진업체는 이미 시공에서 고부가가치 영역인 엔지니어링과 기자재로 중심축을 이동했다. 프로젝트 관리와 서비스로 사업영역을 확장했다. 플랜트가 지식 기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바뀌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 플랜트 산업은 사정이 다르다. 기본 설계기술과 핵심 기자재 역량이 부족해 대외 경쟁력이 떨어졌다. 우리 기업끼리 제살 깎아먹기 수주경쟁을 벌이는 현실이다. 플랜트 산업이 캐시카우 역할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다. 기존 속도와 품질에 기술을 더해 산업 가치사슬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 남들도 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할 수 있는 필살기를 갖춰야 한다.
선진국 기술을 하루아침에 따라잡는 것은 힘들지만 지금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첫째 우리가 강점을 지닌 IT를 접목해 플랜트 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앞으로는 IT가 정보관리, 편의성 제고 차원을 넘어 플랜트 개념 자체를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실제 플랜트의 `아바타` 역할을 하는 가상플랜트를 구축해 실물 플랜트 설계·진단·운전 최적화를 처리하는 것이다. 스마트폰 증강현실 기술을 플랜트 시공과 유지보수에 사용할 수 있다. USN(Ubiquitous Sensor Network)과 로봇을 이용하는 기술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두 번째는 현장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만큼 많은 플랜트를 짓고 다양한 플랜트를 운용한 경험을 가진 나라는 많지 않다. 선진국이 수 백년 동안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플랜트 엔지니어링 분야를 지배했지만 이제는 우리의 현장 자료가 없으면 기술 업그레이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우리가 가진 데이터와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고 가공하면 우리도 고유의 설계·운영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신개념 플랜트 개발도 가능하다. 기술을 선도하는 위치에서 게임의 룰을 직접 정할 수 있다.
기업은 수주실적 우선주의와 시공 위주에서 벗어나 부가가치를 높이고 엔지니어링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바꿔야 한다. 정부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간 균형 잡힌 플랜트 산업 육성에 힘쓰고 민간이 부담하기 어려운 리스크를 분담하는 연구개발(R&D)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기자재를 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해 강건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트랙 레코드(track record)`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한다.
우리나라 플랜트 산업이 현재 실적에 도취돼 `재주 부리는 곰` 신세에 만족하는 과오를 범해선 안 된다.
박상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플랜트엔지니어링PD giant@keit.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