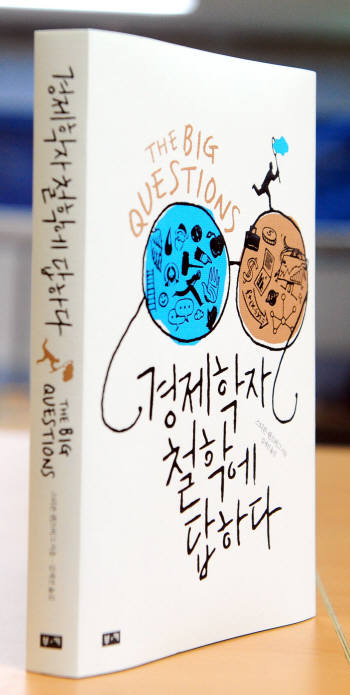
이 책을 읽기 전에 몇 가지 알아두면 좋은 것들이 있다. 도서출판 부키에서 나온 책답게 엄청나게 논쟁적이다. 달리 말해 견해가 같은 사람은 마음에 쏙 들 것이고 다른 사람은 부아가 치밀어 오를 수 있다. 저자 스티븐 랜즈버그는 `발칙한 경제학`이란 교양서로 이름을 얻은 경제학 교수다. 워싱턴포스트 등에 가치중립적으로 보이는 글을 자주 기고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보수 편에 선다.
이 책의 장점은 두 가지다. 랜즈버그는 짧고 명료한 문장을 구사한다. 복잡하고 난해한 개념을 쉽게 풀어낸다. 덕분에 `경제학`이나 `철학`이라는 단어에 짓눌릴 필요가 없다. 다른 장점은 현란한 지식이다. 1000쪽짜리 고전도 1줄로 요약해버리는 마법을 발휘한다. 그런데도 이해하기 쉽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다. 단점은 모든 것을 안다는 듯이 말하는 그의 태도다.
랜즈버그는 근원적인 물음에서 시작한다. 무엇이 존재하는가? 왜 존재하는가? 무엇을 믿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대답으로 종교나 도덕, 직관, 상식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주관적 판단에 기반한 이런 해법들은 사람들을 끝없이 다투게하는 중요한 이유로 작용한다.
그가 제시하는 해법은 수학이다. 수학이야말로 `진리`라고 선언해버린다. `2+2=4`라는 사실은 증명할 필요가 없이 자명한 사실, 즉 공리다. 이것을 설계한 신이 있다고 가정할 필요도 없다. 수학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 더 나아가 세상은 수학으로 이뤄져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판단을 내릴 때 수학을 근거로 제시해야 한다는 게 랜즈버그의 주장이다.
비용과 편익에 따라 모든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은 자본주의 태동기 공리주의자들의 주장과 닮았다. 주관적 가치를 가지고는 사회적 결정을 내릴 수 없으니 객관적 가치,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치척도로 삼자는 철학 말이다. 여기서 `행복`이란 물론 측정 가능한 경제적 가치의 증대를 말한다. 이 같은 논리를 토대로 랜즈버그는 `경제학자의 황금률(Economist`s Golden Rule·EGR)`을 새로운 가치척도로 제시한다. 중요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면 비용과 편익의 관점에서 문제를 재조명해보자는 것이다. 랜즈버그는 EGR가 우리 시대의 도덕이 돼야 한다고 설파한다.
황금률은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정의`와 정반대 위치에 서있다. 이를 의식한듯 랜즈버그는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을 언급하며 `의도보다 결과가 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원래부터 정의인 행동은 없으며 결과가 좋아야 정의라는 생각이다. 정말 그런 것인지 우리 모두 한 번 생각해볼 일이다.
스티븐 랜즈버그 지음, 김세진 옮김. 부키 펴냄. 1만6000원.
김용주기자 ky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