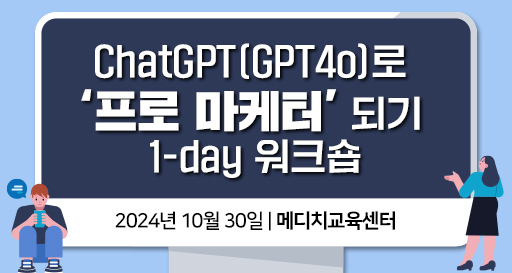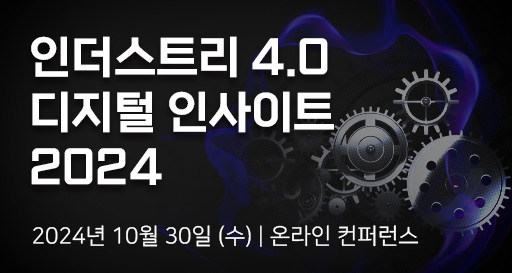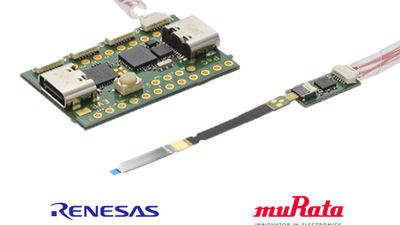중소기업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하나 같이 사람구하기가 어렵다고 하소연이다. 간혹 능력 있는 인재를 뽑으면 1~2년 후 회사를 떠난다. 당연하다. 대다수 구직자들은 높은 연봉과 좋은 근무 환경이 갖춰지고 안정된 대기업을 선호한다. 자금 상황은 어떨까. 높은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중소기업도 은행에서 몇 억원을 빌리기조차 어렵다.
“투자는 커녕, 운영자금도 마련하기 어려워 하루하루 지내기가 지뢰밭을 걷는 심정입니다. 월급날은 왜 이리 빨리 오는지, 입이 쩍쩍 마른다는 말이 요즘처럼 실감날 때도 없습니다.” 최근 만난 한 중소기업 사장의 읍소다.
설상가상 대기업 납품단가 인하 압력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그렇다고 대놓고 이야기도 못한다. 미운털 박히면 그마저도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대다수 중소기업이 대기업 납품업체로 종속되면서 만들어진 결과다.
50여년간 이어진 중소기업의 자생력 부족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중소기업청 산하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한 기관장은 기자에게 ‘3불(不)’를 제시했다. 거래관행의 불공정, 사회인식의 불합리, 자원배분의 비효율이 그것이다.
중소기업은 스스로를 함정에 빠트린다. 대기업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본인들이 납품거래가를 낮추고 유통질서를 흐린다. 매출은 늘겠지만 수익성은 줄어든다. 정글 같은 시장에서 맷집이 약해지는 것은 당연지사다. 대기업과 협력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협력하되 기술과 인프라를 빼앗기지 않는 ‘독한 DNA’를 갖추라는 것이다. 사자가 사냥감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사냥 전 먼저 하늘의 독수리를 쳐다보는 지혜를 되새겨야 한다.
‘중소기업은 안 된다’라는 불합리한 인식도 바꿔야 한다. 중소기업은 연봉이 적고, 비전도 없어 구직자들이 아예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 국내 IT기업 가운데 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튼실한 중소기업이 많다. 이들 기업의 직원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다. 조직에는 생기가 넘친다는 것이 그것이다. 급여가 많아서도, 복지가 좋아서도 아니다.
“저라고 대표이사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목표를 세우고 끈기 있게 하니까 회사에서도 비전을 공유해 주더라고요.” 한 중소기업 해외영업 담당 과장의 말이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 운명은 99%가 CEO에게 달려 있다. 회사의 비전과 핵심가치 공유가 직원들에게 주인의식을 심어준다. 경영자가 먼저 직원을 조직의 부품이 아닌 소중한 주인이라 생각해야 한다. 조급증도 버려야 한다. 사소한 일을 가지고 힘을 소모하는 대신 적절한 순간을 위해 에너지를 아껴두었다가 어려운 상황에서 명확히 대처하는 방법이 현명하다.
포기하지 않으면 이긴다. 비범과 평범의 차이는 도전에 있다. 능력과 무능의 차이도 도전에 있다. 도전이 없으면 무능한 것이다. 성공한 기업은 수많은 시련을 통해 만들어진다. 시련은 기업에 있어 ‘원수’가 아닌 ‘은인’이다.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극복할 수 있는 다시없는 단련의 기회가 된다. IT강국 코리아에 다시 채찍을 가하는 것은 산업의 풀뿌리인 중소기업들이다. 3불(不)을 가슴에 품고, 열정 에너지를 비축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동석 정책담당 부장 dskim@etnews.co.kr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