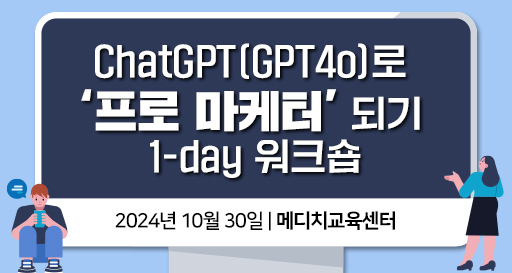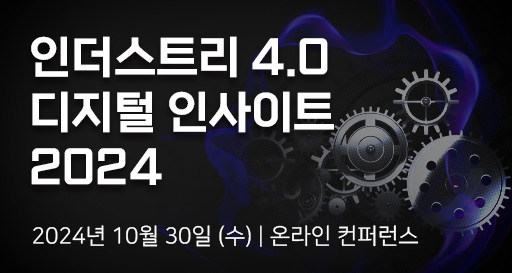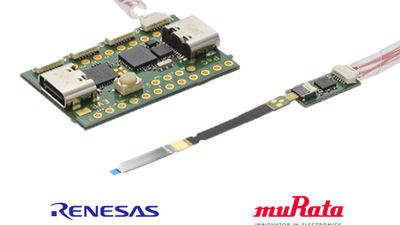요즘 학부모들 사이엔 자식과 페이스북 친구 맺기가 유행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신세대들과 보다 친해지자는 전략이다.
그런데 속내가 따로 있다는 우스갯소리도 심심찮게 들린다. ‘페북 친구’가 되면 아이들을 ‘감시’하는 데 그저 그만이기 때문이다. 일단 친구가 되면 아이의 페북 홈페이지에서 사귀는 친구들이 누군지, 이성 친구가 있는지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아이가 올리는 글에서 요즘 고민이 무엇인지, 속마음도 짐작해볼 수 있다. 이보다 좋은 ‘자식 관리 솔루션’도 없다.
SNS 열풍으로 사생활 엿보기 신드롬이 기승이다. 종전엔 연예인이나 유명인사가 사생활 노출로 곤욕을 치렀지만, 이젠 일반인도 표적이다. 인터넷에 ‘흔적’만 남기면 누구든 안심할 수 없다.
최근 대학생들은 소개팅을 나가기 전 상대방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몰래 엿보기도 한다. 제자와의 문제로 구설수에 오른 어느 교사의 개인정보도 ‘미니 홈피’를 통해 순식간에 확산됐다. 급기야 개인 신상 정보를 집중적으로 검색해주는 ‘신상털기 사이트’까지 등장했다.
한때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에 남긴 글과 사진, 동영상 때문에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다. 한순간 감정으로 트위터에 올렸던 친구 비방글이 나중에 인터넷 검색으로 그 친구가 알게 되는 경우는 치명적이다. 전 세계 5억명이 가입한 페이스북 회원 중에는 사생활 노출로 괴로워하다 자살까지 하는 사례까지 있다.
이 때문에 미니홈피 등을 아예 폐쇄해 버리는 ‘온라인 은둔자’도 늘고 있다. 자신도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이들은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 회원 가입을 철저히 거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전에 썼던 글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신기술을 빠르게 접한 신세대들이 이런 ‘온라인 잠수타기’에 더 적극적이다. 사실 페이스북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탁월한 ‘인공지능’에 깜짝 놀라곤 한다. 10년 전 헤어진 친구와 주고받은 메일주소까지 검색해 ‘혹시 알 수도 있는 친구’라고 추천해준다. 처음엔 신기하지만, 한편으론 섬뜩한 생각도 든다. 이 정도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포털사이트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생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할 수 있다. 그동안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한 키워드를 통해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음식, 속옷 브랜드 등 개인 취향까지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다.
실제로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구글, 빙 등 글로벌 포털사이트에 SNS에 올라온 회원들의 데이터를 돈을 받고 판다. 트위터 약관에는 트위터에 올라오는 모든 콘텐츠를 사용료 지불 없이 영리 목적으로 트위터가 마음껏 쓸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을 정도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해도 이미 올린 글들은 포털 사이트에서 둥둥 떠다닌다.
최첨단 온라인 네트워크 기술이 발전할수록 온라인과 담을 쌓고 고립되는 사람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참 역설적이다.
문명의 이기에 자발적으로 소외되는 현상이 궁극적으로 인터넷 기업에도 좋을 리 없다. 정책 당국도 사생활 침해 문제에 이젠 넋 놓고 있어선 안 된다.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3년마다 한 번씩 자신이 올린 콘텐츠를 인터넷에서 일괄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입법화하는 방안은 어떨까. 오프라인에서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듯, 온라인에서도 이젠 ‘잊혀질 권리’를 찾아야 할 것 같다.
장지영 컨버전스팀장 jyajang@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