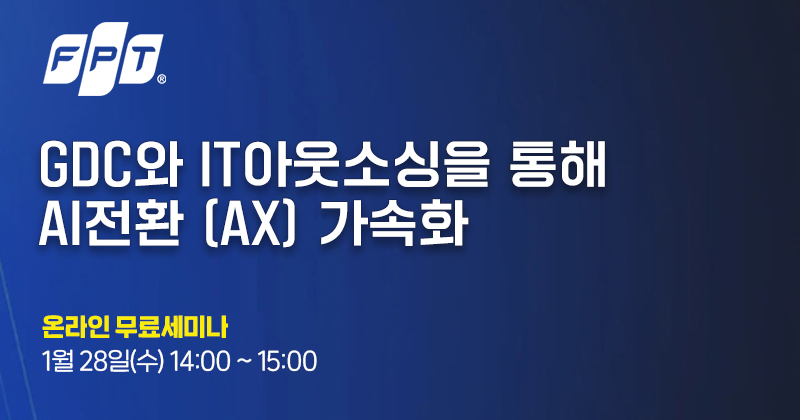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009년 e러닝산업 매출액 분포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009년 e러닝산업 매출액 분포 총 1368개 업체 중 매출 1억원 미만 771개(56%), 1억∼10억원 미만 289개(21%).
동네 슈퍼마켓 업종 현황이 아니다. 신성장동력, 미래의 먹거리 중 하나로 분류되는 이러닝 산업의 지난해 매출 집계다. 업계에선 대형업체의 지나치게 까다로운 견제 속에 산업이 영세성을 벗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연매출 1억원 미만 업체들이 가장 많이 몰린 곳은 대형 서비스업체의 하청을 받는 콘텐츠 공급(CP) 분야다. 90%가 넘는 CP가 매출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업체다. 대형 서비스업체들은 소규모 CP의 콘텐츠를 공급받아 운영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 이 때문에 계약서 상에 콘텐츠 공급 여부를 대외에 누출하지 말 것을 엄격하게 명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CP는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성장 활로를 찾기 어렵다.
선두권업체인 삼성SDS 멀티캠퍼스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한 관계자는 “멀티캠퍼스의 경우에는 콘텐츠를 공급하는 업체가 200개가 넘는다”며 “대부분 소규모의 전문 CP이며, 이 분야 종사자도 어떤 CP가 어느 서비스업체에 공급하는지 거의 모른다”고 말했다.
수익배분 역시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다. 평균적으로 콘텐츠 거래는 3시간 정도 분량에 5000만원가량의 단품으로 이뤄지고 있다. CP업체들은 “최대한 인건비를 줄여서 수지를 겨우 맞출 정도의 수준”이라고 입을 모은다.
게다가 최근 노동부의 환급 규정이 엄격해지면서 갈수록 단가도 떨어지고 있다. 소비자 판매 실적에 따른 ‘러닝 개런티’가 따라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 잘 팔리는 콘텐츠를 만들어도 더 높은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러한 구조가 결국 콘텐츠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CP업체는 질 좋은 상품을 내놔도 시장에 알려지지 않아 영세한 규모를 키우기 힘들다”며 “따라서 최소 비용을 투입해 최단기간에 콘텐츠를 만들어 납품하게 된다”고 말했다.
CP뿐만 아니라 솔루션·개발업체 등도 마찬가지다.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이러닝 해외 수출 사업 등에 대형업체와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 솔루션업체들은 하나같이 고민이다. 현실적으로 대형 업체와 협력하지 않으면 해외 시장에 나가기 어렵지만, 대형업체의 지나친 요구를 들어주는 것도 힘에 부치기 때문이다.
사우디 교육정보화 사업 진출을 꾀하고 있는 한 업체의 관계자는 “해외 진출시 AS 등의 책임은 다 지우고 수익이나 브랜드 마케팅은 거의 보장되지 않는 실정이라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