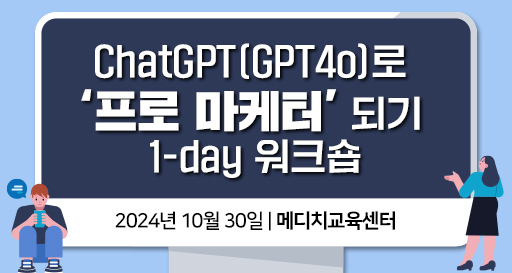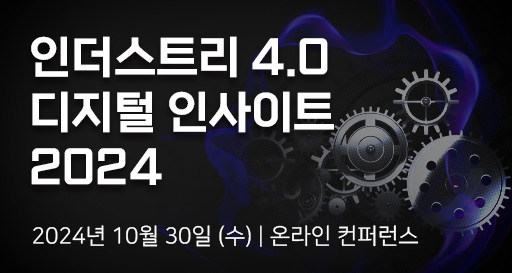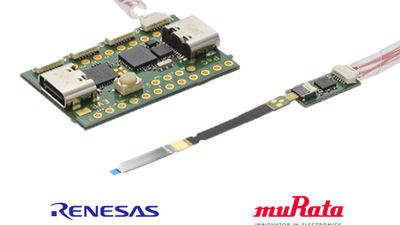6개월 동안 관악산에 올랐다. 험산이라고 하지만 그에겐 동네 뒷산이나 마찬가지다. 매일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다 보니 눈 감고도 오를 판이다. ‘젊은 사람이 이 시간에 여기는 왜 오지?’ 하는 의아한 눈빛도 이젠 낯설지 않다. 어디쯤 오르면 집사람과 아들 생각이 나고 또 어디쯤 오르면 앞날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밀려오는지도 안다. 그래서 그의 관악산에는 몇 개의 무덤이 있다. 생각을 묻어둔, 봉분이 작은 무덤이다. 뉘엿뉘엿 해가 질 때쯤이면 컬컬한 하산주 한 잔이 그의 하루를 정리해준다. 오늘도 한 것이라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묻고 온 게 고작이다.
정장이 벗겨진 ‘사오정’들에겐 갈 곳이 마땅치 않다. 제복 같은 반듯한 복장이 거추장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막상 벗고 나면 오히려 행동반경은 더 좁아진다. 이웃의 눈치를 봐야 하고, 무엇보다 믿고 따르는 가족들의 불안한 눈길이 더욱 움츠러들게 한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죄인이 된 듯한 ‘더러운 기분’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관제 불황’의 주역들이 더 밉고 야속하다.
뒤지지 않게 공부하고 뒤지지 않게 일했다. 지난 세월 투명한 유리봉투의 월급으로 근근이 살아왔다. 힘겨운 나라살림을 위한 ‘납세머신’으로서의 공도 크다. 나라가 시키는 모든 의무도 군말 없이 받았다. 군대도 갔다 왔으며 예비군도, 민방위도 모두 성실히 마쳤다. 심지어 교통범칙금도 연체한 적이 없다. 하지만 결국 맞이한 건 퇴출이다. 딱히 능력 부족의 이유로 댈 거리도 없다. 위로삼아 하는 말이지만 ‘운칠복삼(運七福三)’이 맞다.
가정에서도 크게 틀리지 않다. 지금도 낡은 카세트를 안고 사는 ‘아버지의 뽕짝’과 손가락 마디만 한 MP3에 죽고 못 사는 ‘아들의 랩’ 사이에 설 자리가 없다. 제복문화에 익숙한 탓에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도 여의치 않다. 꿈 없고 소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정해준 위치가 자유로운 표출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다. 김정구와 동방신기 사이에서 ‘나의 노래’는 실종 상태다.
하지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사오정의 저력은 살아 있다. 천편일률의 강요된 교육을 받았지만 아버지 세대에 없던 세계 일류상품을 수십개 만들었다. 인터넷 초강대국을 만들었다. 세계 수출 11위의 꽃을 피운 주역들이다. ‘노력’밖에 없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험로를 마다하지 않고 걸어왔다. 능력 없는 구세대로 몰락해 갈 곳이 산밖에 없는 처지지만 지식의 진보를 이뤄 과학화된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다.
‘경제음치’들의 불협화음에 대낮부터 산을 찾아야 하는 이 시대의 사오정들은 안타깝다. 그들은 전파음에 익숙하고 휴대폰의 거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신세대들과 다르게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살아 있다. 욕하기보다 개선점을 찾아내려는 긍정적 사고도 살아 있다. 용도폐기된 고물이 아니라 부도에 눈물을 흘리며 내다판 ‘쌩쌩’한 기계다. 비정규직마저 맘 편히 일할 수 없는 ‘바보 정치’에 희생되기에는 너무 한이 많다. 가격 대비 성능이 매우 뛰어난 고급 장비들이기 때문이다.
사오정은 양보와 배려의 미덕을 발휘해 스스로 초라해진 사람들이다. 창피할 것도, 남의 눈을 피할 것도 없다. 아직 벼를 익힐 만큼 태양도 남아 있다. 또 단비가 내릴 수 있는 기회도 있다. 다시 모내기를 시작해 추수까지 이모작의 충분한 풍요의 기회가 있다. 아직도 이 시대의 주인공은 ‘사오정’이다.
이경우부장@전자신문, kwlee@etnews.co.kr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