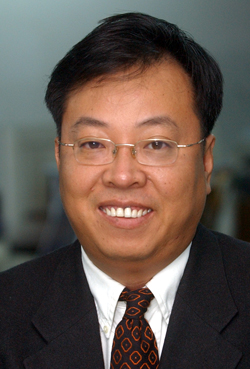
NHN과 다음이 최근 나란히 수장을 관리형 CEO로 교체했다. 성장 둔화를 돌파하려는 조치다. 아마도 새 CEO들은 성장보다 수익 관리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관리가 필요하다. 구글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과 래리 페이지는 창업 3년 만에 회사가 훌쩍 커지자 전문 기업인 에릭 슈미츠를 영입했다. 이미 대기업 반열에 오른 NHN과 다음의 관리형 CEO 선임은 어찌 보면 늦은 셈이다. 이해하면서도 조금 씁쓸하다. ‘모험’과 ‘열정’이라는 벤처의 덕목이 쓸모없어진 시대가 벌써 왔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IMF 체제 이후 대기업과 대학, 연구소라는 이른바 ‘온실’에 있던 사람들이 바깥으로 쏟아져 나왔다. 벤처 창업 열풍이다. 2001년에 급격한 거품 붕괴와 투자자 몰락의 생채기를 남겼지만 IMF체제 조기 졸업에 큰 힘이 됐다. 당시 사람들이 벤처 행을 택한 동기는 단순했다. 깨진 ‘평생고용 신화’의 대안일 뿐이다. 현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버금가는 당시 벤처 육성 정책도 일조했다. 안정 대신에 모험을 선택한 이유를 가족에 설득하기 충분했다.
10년 새 수많은 벤처 스타들이 뜨고, 졌다. 초기 벤처 스타들은 거품 붕괴 이후 무대 뒤로 사라졌다. 일부는 재기를 꿈꾸지만, 여의치 않다. 지금 벤처산업계를 이끄는 사람들은 벤처기업서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다. 이전 세대에 비해 벤처 비즈니스는 물론 금융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 모럴 해저드도 적다. 반면, 스타가 없다. 무엇보다 위험을 떠안겠다는 ‘벤처 정신’이 위축됐다.
앞으로 달라질까. 유감스럽게도 회의적이다. 벤처 생태계는 더 나빠지지 좋아질 기미가 없다. 벤처 캐피탈과 코스닥 시장이라는 젖줄도 이미 말랐다. 더욱이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부 정책은 벤처보다 대기업 우선이다. 창업 열기도 예전 같지 않다. 대기업도 힘들어 하는 불황 속에 ‘시베리아 벌판’으로 나갈 용기가 옴츠러들었다. 대학과 연구소 창업도 더욱 썰렁하다. 이공학도는 대기업이든 중소벤처기업이든 엔지니어의 길을 가려 하기보다 로스쿨이나 MBA를 기웃거린다. 엔지니어들도 이왕 벤처 신화를 이룬다면 휴맥스, NHN, 엔씨소프트보다 미래에셋에 더 매력을 느끼는 판이다.
그래도 벤처산업을 버릴 수 없다. 실업과 내수 부진, 이공계 기피 등을 한꺼번에 해결할 도구로 벤처만한 게 없다. 기업의 투자도 북돋울 수 있다. 정부는 투자를 독려하지만 대기업은 꿈쩍도 안 한다. 태생적으로 리스크를 감수하는 벤처기업은 다르다. 벤처기업 투자는 개별적으로 보잘 것 없지만 모으면 크다. 벤처 창업 붐을 다시 일으켜야 하는 이유다.
정부가 지난주에 ‘1인 창조기업 육성’ 정책을 내놓았다. 10년 전 벤처 정책에 버금가는 국가 아젠다로 삼았다는 얘기도 나왔다. 현 정부가 벤처에 관심을 보였다니 다행이다. 정부 지원을 계기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다양하게 사업화하는 길이 열렸으면 한다. 하지만, 벤처 생태계 복원 없이 새 육성책이 성공할지 의문스럽다. 10년 된 벤처기업도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는 판에 개인 기업이 성공할 수 있을까. 정부가 1인 창조기업을 자칫 실업률 낮추는 용도로 쓰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신화수기자@전자신문, hssh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