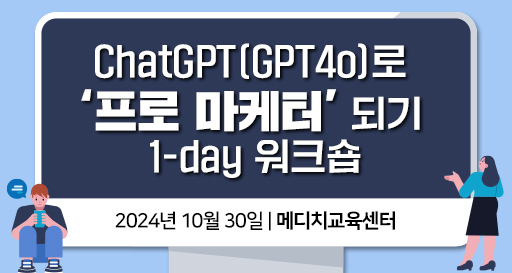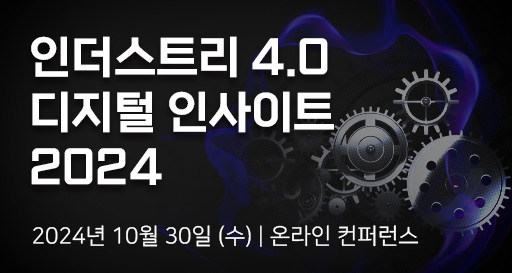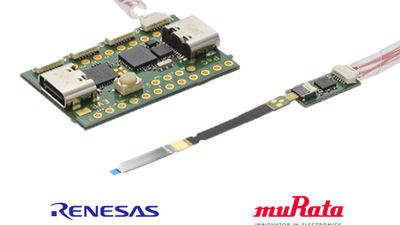2009년 3월. KT나 SK브로드밴드 같은 기간통신사의 시스템이 장애를 일으켜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됐다고 가정해 보자. 가깝게는 네이버 지식IN이나 구글 같은 검색사이트는 물론이고 인터넷쇼핑·인터넷전화·인터넷뱅킹 등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습관처럼 PC 앞에 앉아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정보도 얻고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던 사람들은 갑자기 세상이 불편해지고 답답해졌음을 느낀다. 개인이야 불편함과 답답함을 얼마간 감수하면 된다 쳐도 기업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전자문서를 통한 사내 결재업무는 제쳐놓고라도 대금결제가 제때 되지 않아 멀쩡한 기업이 부도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 인터넷이 없다는 것은 전기가 없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2003년에 터진 1·21 인터넷 대란이 또다시 온다는 생각은 상상하기조차 두렵다.
1990년대 중후반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고 야후·다음·심마니 등 검색에 기반을 둔 포털이 주가를 올릴 때만 해도 인터넷이 이 정도까지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당시 염진섭 야후코리아 사장을 비롯한 닷컴 전도사를 자처한 닷컴 CEO들은 ‘인터넷은 생활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그런 세상이 이렇게 빨리 오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오히려 인터넷이 바꾸는 새로운 세상을 귀찮아 하고 불편하게 생각했다. 오프라인으로도 충분히 불편하지 않게 해오던 일을 굳이 온라인화할 필요가 있느냐는 게 이유였다. 인터넷이라는 전무후무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위력을 알아보지 못한 일부 전통기업은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소리없이 사라졌다. 반면에 포스코 같은 거대 기업은 이 같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찌감치 감지해 체질을 과감하게 바꾼 덕에 지금까지도 성공사례로 손꼽힌다.
인터넷 붐과 함께 신생 벤처들은 ‘인터넷’을 뜻하는 ‘.(닷)’을 상호에 붙이기 시작했고 기존 전통기업이나 솔루션 기업들도 ‘e비즈니스’를 뜻하는 ‘e’를 각종 사업 앞에 붙여 기업의 비전을 표시했다. ‘e’ 없는 기업은 그야말로 ‘일없는’ 기업으로 치부되기 십상이었다. 상장사들도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e비즈니스나 인터넷기업 이미지만 주면 주가가 폭등했던 때였던만큼 상호에 ‘닷컴’ ‘e∼’ ‘디지털’ ‘i∼’ 같은 말을 넣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바보 취급을 당하기도 했다. 2000년대 초반까지 닷컴 잔치는 계속됐다.
얼마 전 ‘코드그린’의 저자인 토머스 프리드먼이 방한해 한 말이 기억난다. 그는 “지금 우리는 그린혁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린 파티를 즐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어갔다. “지금은 그린 카·그린 홈·그린 도시·그린 에너지를 강조하지만 그린 혁명이 끝나는 날은 카·홈·에너지라는 단어 앞에 ‘그린’이라는 수식어가 없어질 때”라고 단정지었다. 그린이 추구하는 에너지효율성·친환경성 등을 모두 만족하는 자동차나 집이 보편화하면 단어 앞에 ‘그린’이라는 수식어를 굳이 붙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기업들이 굳이 ‘e비즈니스한다’ ‘우린 닷컴기업’이라고 강조하지 않아도 그 기업 속에는 인터넷이라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흐르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주문정 그린오션 팀장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