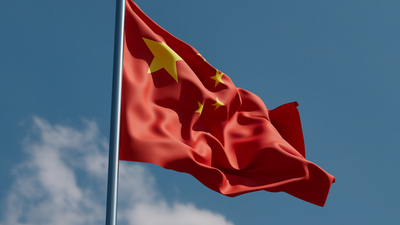보안업계 시장 확대 발걸음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국내·외 보안업체 매출 증감률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국내·외 보안업체 매출 증감률 세계 보안 시장을 주도하는 외국 보안업체들이 시장 확대를 위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근들어 외국 보안업체들은 인수합병이나 전략적 제휴 등 사업 확대를 위한 사전정지작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매출에 있어서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일궈내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내 보안업체들은 게걸음을 걷고 있다. 폐쇄적인 경영을 반복하고 있으며 매출 역시 2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산 업체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국내 보안 시장에서 조차 외국 보안업체의 도전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규모의 경제 vs 각개전투=최근 세계 보안 업계의 중요한 이슈는 인수합병이다. 세계 보안시장을 주도하는 주요 업체들은 기술력이 뛰어난 보안 업체를 무더기 인수·합병함으로써 이른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
세계 최대 보안업체인 시만텍은 지난 9월 스토리지 보안 업체인 파워퀘스트를 인수했고 지난달에는 가상사설망(VPN) 업체인 세이프웹과 애플리케이션 보안업체인 온테크놀러지를 차례로 합병했다.
시만텍을 추격하고 있는 네트워크어쏘시에이츠 역시 차세대 보안솔루션으로 부상하고 있는 침입방지시스템(IPS) 업체인 인트루쉴드와 엔터셉트를 인수했다. 방화벽 시장을 선도하는 넷스크린도 작년에 보안업체인 원시큐어에 이어 최근 VPN 업체인 네오테리스를 인수합병했다.
전략적 제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소프트웨어 방화벽의 일인자인 체크포인트는 하드웨어 보안 기술을 갖고 있는 노키아와 손을 잡고 하드웨어 방화벽을 출시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넷스크린은 기업용 백신 시장의 강자인 트렌드마이크로와 협력해 방화벽과 백신 기능을 함께 갖춘 제품으로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수합병과 전략적 제휴로 공격경영을 펼치고 있는 외국 보안업체들에 비해 국내 보안업체는 각개전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말만 무성하던 인수합병은 물 건너간 분위기고 보안업계의 거품이 많았던 시기에 줄을 잇던 전략적 제휴도 자취를 감췄다.
△실적 성장에서도 큰 차이=외국 보안업체와 국산 보안업체의 실적 측면에서도 명암이 갈리고 있다.
시만텍은 지난 2분기 4억2900만달러의 매출을 올려 전년 동기의 3억2500만달러에 비해 32% 성장했다. 순이익 역시 5200만달러에서 8300만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넷스크린의 지난 2분기 매출은 643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의 3640만달러보다 무려 77% 가량 늘어났다.
반면 국산 보안업체의 매출은 작년 실적과 비슷한 양상이다. 국내 백신 시장의 절대강자인 안철수연구소는 올해 상반기 119억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는 작년 상반기 12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가상사설망 시장 수위 주자인 퓨쳐시스템는 작년 상반기 91억원에서 올해 상반기는 106억원으로 소폭 성장했고 침입탐지시스템(IDS) 시장의 선도 업체인 윈스테크넷도 32억원에서 33억원으로 성장하는데 그쳤다.
다만 퓨쳐시스템, 인젠, 이니텍, 코코넛 등의 업체가 지난해 적자에서 올해들어 흑자전환에 성공했다는 사실 정도를 위안으로 삼고 있는 분위기다.
△효과적인 협력 모델 발굴 필요해=외국 보안업체와 국산 보안업체의 이러한 차이는 국내 보안 시장의 판도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는 K4 인증 등 외국 보안업체에 대한 진입 장벽으로 인해 공공시장에서 국산 업체들이 절대 우위를 보였다. 하지만 외국 업체들이 민간 시장 공략을 강화하면서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내 보안 업체 간 효과적인 협력 모델을 발굴하는데에서 해법 찾기를 시작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이홍렬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올해 초까지 소문이 많았던 인수합병설은 최근 사라졌으며 제품 개발이나 마케팅 협력을 골자로 하는 전략적 제휴도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단기적인 매출 확대에 급급해 장기적인 전략을 세울 여유가 없는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모 보안 업체의 사장은 “국내 보안업체 가운데 기술적 경쟁력을 가진 업체끼리 협력은 가능하지만 협력을 하려고 해도 수익 배분 등의 문제에서 항상 걸린다”며 “아직 이렇다할 성과를 낸 협력 모델이 부재해서 모두들 방향을 잡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