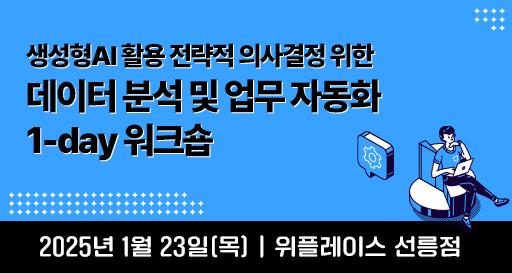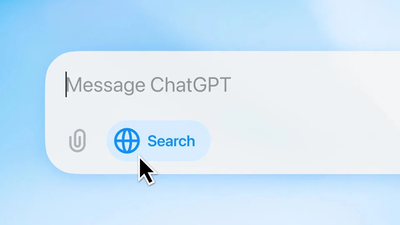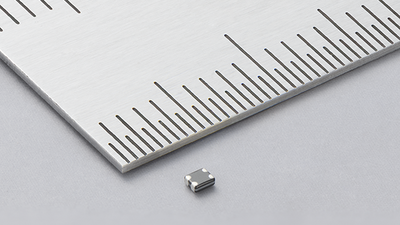80년대 후반 한국의 로봇산업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만 보였다.
로봇자동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는 지나칠 정도로 높았고 똑똑한 학생들이 대거 로봇관련학과로 몰려들었다. 로봇기술이 위기에 빠진 한국제조업의 경쟁력을 한단계 끌어올릴 것이란 희망에 다들 부푼 시기였다. 하지만 한국 로봇산업은 초반부터 구조적 결함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대기업들은 당시 국내기반이 전무했던 자동화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업체, 특히 일본로봇업체와 제휴에 매달렸다. 우리나라 가전과 자동차산업이 초창기 그랬듯이 우선 외산로봇을 들여다 팔면서 하나둘 부품을 국산화하면 머지않아 자체 기술력도 쌓이고 로봇산업이 본궤도에 진입할 것이란 계산이었다. 그러나 산업용 로봇은 전기만 꽂으면 저절로 돌아가는 컬러TV와는 전혀 성격이 달랐다. 우선 로봇을 생산라인에 제대로 설치, 운용하려면 매뉴얼에 적혀있지도 않은 고도의 현장응용기술이 필요했다. 일본기술자들이 수십년간 생산현장에서 익힌 자동화 노하우는 애당초 국내 대기업이 돈으로 살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었다. 며칠 전에 로봇포장을 처음 뜯어본 우리 기술자들이 설치한 로봇설비는 산업현장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켰고 자동화에 대한 열기도 점차 식어갔다.
여기에 협소한 내수시장은 처음부터 국내 로봇산업의 발목을 붙잡았다. 한국의 로봇시장은 90년대 중반까지 금액기준으로 일본의 30분의 1에 불과했다. 한 업체가 내수시장을 독점해도 수익을 내기 힘든 판국이었으나 재벌 불패의 성장신화에 빠져있던 금성·삼성·대우 등은 오로지 각개약진만을 고집했다. 이들 대기업이 밀어붙인 로봇사업은 자동차, 가전분야 계열사의 생산성을 높였고 외국 로봇업체의 횡포를 견제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손바닥만한 내수시장을 재벌그룹들이 쪼개놓고 대부분의 핵심부품까지 일본에서 수입하는 상황에서 국내 로봇기업들이 일본과 격차를 줄이기란 애당초 불가능해 보였다.
90년대 중반쯤에는 국내 자동차, 전자산업에 대규모 자동화투자도 거의 끝났다. 뒤이어 밀어닥친 외환위기와 함께 로봇산업에는 본격적으로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값비싼 기술인력이 모여놓고도 돈을 못버는 애물단지로 찍힌 로봇사업부문은 대기업 구조조정과정에서 잇따라 시련을 겪었다. 세상은 다시 바뀌어 정보화 사회로 진입했다. 굴뚝산업이 사양길로 간주되고 생산자동화보다 인터넷, IT가 한국경제를 이끄는 키워드로 떠오른 것이다. 국내 로봇인력들은 화려한 인터넷 벤처열풍을 바라보며 제조업 종사자로서 상대적 서러움을 한동안 곱씹어야 했다.
요즘 로봇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 고조되면서 로봇산업이 2010년까지 자동차산업과 맞먹을 것이라는 등 출처가 불분명한 장밋빛 전망이 나돌고 있다. 증시도 복권도 운대가 맞아야 뜨는 법인데 로봇산업이 언제 어떻게 뜰지 그 누가 알겠는가.
<배일한기자 bailh@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챗GPT 검색 개방…구글과 한판 승부
-
2
SKT, 에이닷 수익화 시동...새해 통역콜 제값 받는다
-
3
비트코인 11만달러 눈앞…트럼프 發 랠리에 20만달러 전망도
-
4
올해 하이브리드차 판매 '사상 최대'…전기차는 2년째 역성장
-
5
에이치엔에스하이텍 “ACF 사업 호조, 내년 매출 1000억 넘긴다”
-
6
갤럭시S25 '빅스비' 더 똑똑해진다…LLM 적용
-
7
테슬라, 3만 달러 저가형 전기차 첫 출시
-
8
“팰리세이드 740만원 할인”…車 12월 판매 총력전 돌입
-
9
정부전용 AI 플랫폼 개발…새해 1분기 사업자 선정
-
10
곽동신 한미반도체 대표, 회장 승진…HBM 신장비 출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