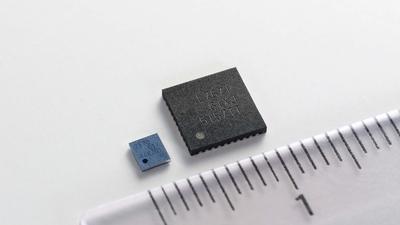국내 은행권이 예대마진 축소와 대출 성장 둔화, 건전성 비용 증가, 자금 이탈 가속화가 동시에 겹치며 구조적 하방 압력에 직면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디지털 전환이 경쟁력을 가르는 국면에서, 제도적 신뢰를 디지털로 구현하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6일 서울 을지타워에서 열린 싱귤래리티 금융 소사이어티(SFS) 제10차 포럼에서 “은행은 지금 수익성과 건전성 모두에서 하방 압력이 커지는 국면”이라며 “단순한 경기 순환이 아니라 구조적 성장 정체와 경쟁 심화가 본질”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은행의 위기 요인을 크게 네 가지로 정리했다. 먼저 여신 경쟁 심화다. 그는 “20년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이 은행 수익성을 이끌어 왔다“면서 “현재는 가계대출 규제와 중소 제조업 위축으로 대출 증가율은 구조적으로 둔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기업대출 확대 경쟁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두 번째는 수신경쟁 심화다. 김 위원은 “주식시장 활성화와 증권사의 발행어음(IMA) 등 대안 상품이 늘면서 은행 예금의 대안 선택지가 많아진 상황“이라고 짚었다.
셋째는 '생산적 금융' 확대 과정에서의 트릴레마다. 김 위원은 “은행산업 수익성 확보에 대한 비판적 여론 속에서 은행의 공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어 수익성 방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기조에서 기업 대출 확대와 재무안정성 유지 간 불균형적 성장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사이클과 맞물려 생산적 금융을 공격적으로 늘릴 경우, 적정 연체율과 자본 비율 등 건전성 지표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딜레마가 커진다는 설명이다.
넷째는 건전성 관리 부담 확대다. 김 위원은 “환율 상승에 따른 위험가중자산(RWA) 확대와 바젤3 최종안의 RWA 하한 규제 강화까지 겹치면서 자본 비율 유지 압박이 커졌다”며 “현재 BIS 비율 등 건전성 지표는 표면적으로 양호하지만, 향후 하방 압력이 점차 강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은 중장기적으로 은행의 기능 자체가 변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AI와 빅데이터가 발전하면서 정보 비대칭성이 완화되고, 은행이 독점해온 '정보 우위'가 약해지면 단순 중개 기능의 부가가치는 하락한다”고 말했다. 탈중개화가 진행될수록 '대출-예금' 중심의 전통 모델만으로는 성장 한계가 뚜렷해진다는 의미다.
은행업의 본질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 됐다. 김 위원은 “단순 여·수신 업무를 넘어 디지털 경제와 실물자산을 연결하는 새로운 금융 생태계의 주도권을 만들어가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중앙은행 최종대부자 역할로서 인허가를 기반으로 한 제도적 틀이 유지되는 한 신용창출 등 독점적 지위가 단기간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도 덧붙였다.
증권업 역시 위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 위원은 “기술 발전으로 거래비용과 탐색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증권업 역시 핵심 수익원인 위탁매매 수수료는 필연적으로 하락하는 구조적 하방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증권업도 고객 유동성을 중개하는 채널 및 담보의 표준을 제공하는 기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짚었다.
김 위원은 디지털 경쟁 환경에서 은행이 선택할 수 있는 핵심 카드로 예금 토큰화(Tokenized Deposits)를 제시했다. 그는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확산하면 지급결제의 주도권이 은행 밖으로 넘어갈 수 있다”며 “은행의 신용과 예금자보호 제도를 기반으로 한 '예금 토큰'이 신뢰를 바탕으로 즉시성과 프로그래밍 기능을 구현하는 데 성공한다면, 새로운 금융 시스템으로 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