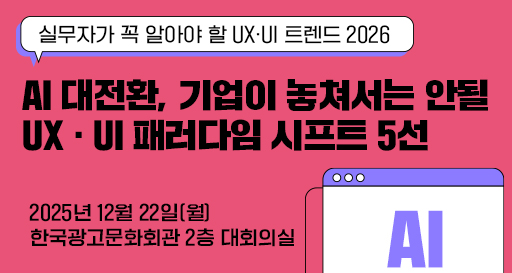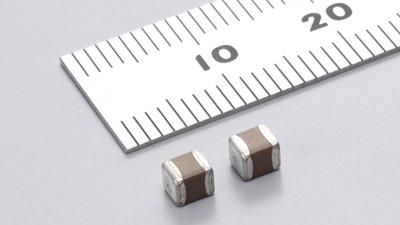미국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검증 요건을 강화하면서 비자 심사가 지연되자 구글과 애플 등 거대 기술기업들이 외국인 직원들에게 미국 밖 출국을 자제하라고 다시 한 번 권고했다.
미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는 20일(현지시간) 구글의 외부 법률자문을 맡은 BAL 이민법률사무소가 최근 직원들에게 '미 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 도장 발급 예약이 최대 12개월까지 지연되고 있다'며 장기 체류 위험을 이유로 해외 출국을 피하라고 안내했다고 보도했다.
애플도 유사한 조치를 취했다. 애플의 자문사 프래고먼은 “유효한 비자 도장이 없는 직원들은 해외여행을 강력히 자제해야 한다”며 “여행을 연기할 수 없는 경우 사전에 애플 이민 담당팀이나 자문사와 협의하라”는 메모를 직원들에게 전달했다.
이같은 권고는 미국 정부가 비자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의 SNS 활동 검증을 본격화한 이후 심사 지연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미 국무부도 심사 지연 사실을 인정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비즈니스인사이더에 “신청자의 온라인 활동을 검토 중”이라며 “현재 전 세계 대사관과 영사관은 처리 속도보다 각 비자 사안을 철저히 심사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과 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은 해외 전문 인력 채용에 주로 H-1B 비자를 활용하고 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직을 대상으로 기본 3년 체류가 가능하며 연장과 영주권 신청도 허용된다. 다만 연간 발급 한도는 8만5000건이다. 지난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H-1B 비자 5537건을 신청했고, 애플도 3880건을 접수했다.
그러나 미국 보수 진영에서는 H-1B 비자가 인도를 비롯한 외국인 유입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지난해 9월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대폭 인상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등 주요 기술기업들은 당시에도 직원들에게 해외 출국 자제를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19개 주는 비자 신청 수수료 인상에 반발해 지난 12일 소송을 제기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