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AI)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고대역폭메모리(HBM)에 이어 D램과 낸드플래시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면서 세계 반도체 업계 곳곳에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미국 마이크론은 3일(현지시간) 소비자용 메모리 사업 철수를 선언했다. 지난 1996년부터 선보인 소비자용 메모리 '크루셜'을 2026 회계연도 2분기(내년 2월)까지만 출시한 뒤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마이크론은 AI 데이터센터용 메모리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수익성 낮은 소비자용 사업을 정리하고, AI 인프라 투자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기업용 제품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수밋 사다나 마이크론 최고사업책임자(CBO)는 “빠르게 성장하는 AI 기반 데이터센터 시장에서 전략 고객들을 위한 공급과 지원을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 사업에서 철수한다”고 말했다.
마이크론의 결정은 시장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준다. 기존 메모리의 최대 수요처인 PC와 스마트폰 시장을 AI 데이터센터가 추월했다는 의미다.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올해 데이터센터용 반도체 매출은 1560억달러로 스마트폰을 처음 역전하고, 2030년에는 3610억달러로 2배 이상 확대가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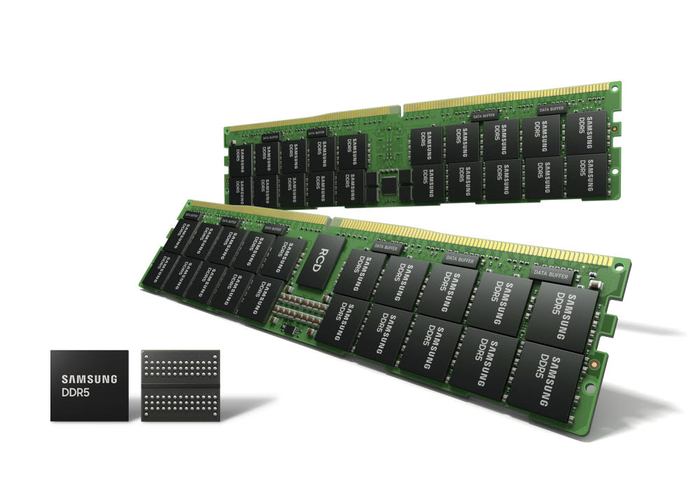
AI 데이터센터 메모리 집중은 기존 반도체 공급망도 변화시키고 있다.
삼성전자와 샌디스크로부터 낸드를 조달해 소형 플래시 메모리와 드라이브 등 저장장치를 제조하는 대만 트랜샌드는 10월부터 칩을 1개도 공급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와 샌디스크가 데이터센터용으로 낸드 공급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같은 영향으로 10월 범용 D램 평균 재고는 2~4주 수준으로 지난해 말(13~17주) 대비 대폭 감소했다. 일본 전자제품 상점에서는 재고 부족으로 개인당 메모리 모듈과 저장장치 구매를 4개에서 8개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외신 보도도 나온 바 있다.
공급난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제조사들이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증설에 보수적인 입장인 데다, 투자를 결정해도 공급량이 늘어나는 건 2~3년 뒤이기 때문이다.
AI 데이터센터의 메모리 흡수로 PC와 스마트폰 시장 역시 변화가 예상된다. 메모리 가격 인상에 따라 완제품 가격 변동이 불가피해졌고, 생산 측면에서도 재고 부족으로 당초 계획분을 채우지 못하는 비상 상황이 나타날 전망이다.
트랜센드는 “낸드를 납품받지 못해 지난 한 주에만 제조 비용이 50~100% 급증했다”고 밝혔다. 델과 샤오미 등은 메모리 공급 부족에 따른 비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기기 가격 재조정 등 출고가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이호길 기자 eagle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