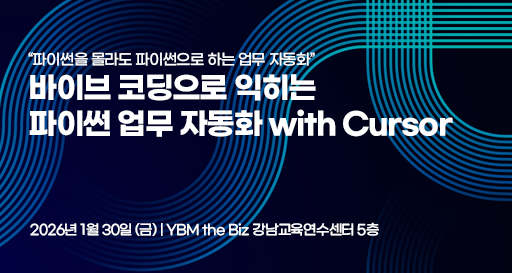초고령화 사회가 도래하고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는 시대. 새로운 일자리, 지금과 다른 삶을 일궈나가려는 이들이 늘면서 '평생교육'에 눈을 돌리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평생교육 시스템이 구조적인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에듀플러스는 대학, 기관 등에서 평생교육을 맡고 있는 리더들을 만나 평생교육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평생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본다.
“공부의 시작은 안다는 것인데요. 지행일치(知行一致)라는 말을 살펴보면, 안다는 것과 한다는 것이 일치되지 않으면 배운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뜻하죠. 삶은 앎과 함이 순간순간 나타나는 것으로,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평생교육은 '삶을 위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한용진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은 인터뷰 동안 한국 사회의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사회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면 속도는 느리더라도 결국은 평생교육의 시대로 바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은 어떤 일을 하나.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은 기본적으로 평생교육의 진흥, 지원, 정책을 맡는다. 현재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은 4개의 시민대학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평생교육이 구 단위로 진행됐다면 이제는 동 단위로 내려가는 추세다. 시민들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과 거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구 단위 평생교육 담당자의 교육 지원, 평생교육 정책의 방향 설정 등도 주요 업무다.
-최근 평생교육의 변화 추세는 어떤가.
▲학교 교육의 의무가 평생교육의 보편으로 이동하고 있다. 과거에는 인생을 1단계 학교 교육, 2단계 취업, 3단계 은퇴 등의 순서로 생각하는 경향이 컸지만, 이제는 생의 주기를 단계별로 나눌 수 없는 사회가 됐다. 고령화, 조기 은퇴 등의 사회적 변화는 결국 순환 교육의 필요성으로 나타날 것이다. 평생교육 시대는 '창업'이 중요한 키워드다. 누군가에게 종속된 삶에서 독자적인 삶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이 필요하다.

-평생교육을 보편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자기 주도 학습이 시민의 보편적 권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평생학습휴가제'처럼 직장인이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평생학습을 위한 예산도 늘릴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평생교육 예산은 전체 교육 예산의 1%밖에 안 된다. 앞으로는 평생교육 예산을 전체 교육 예산의 20~30%까지 확보해야 한다.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 또한 시민의 실생활 동선과 가까운 곳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려대 평생교육원장도 역임했다. 대학의 평생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나.
▲학령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이 살아남으려면 평생교육만이 답이다. 현재 해외 유학생 유치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대학의 캠퍼스를 성인 대상 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성인 퇴직자가 대학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교육받는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학은 교육 대상뿐 아니라 교육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 패러다임에 맞게 대학도 변화해야 한다.
-인공지능(AI) 시대, 국내 평생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평생교육에서 잃지 말아야 할 것은 인문 교양이다. 인간다운 태도, 휴머니즘, 관계 등이 더욱 중요한 시대가 오고 있다. 앞으로의 평생교육은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방법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AI 시대는 지식과 정보는 많지만 인간성을 상실한 사람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마송은 기자 runn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