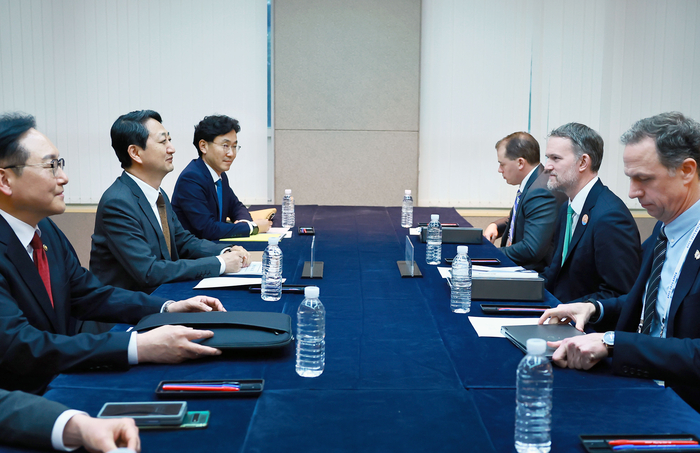
한국과 미국이 이번주 미국 워싱턴DC에서 만나 관세 협상에 나선다. 2차 기술 협의로 양국은 협의 의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우리나라 입장에선 미국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청구서'를 받는 자리기도 해 관세 협상의 중대 변곡점이다.
관건은 미국의 요구 사항과 시간이다. 미국이 그간 장외에서 던진 수많은 요구 사항 중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정해진 시간 내에 협상을 완료할 수 있을지가 주요 관심사다.
환경은 녹록지 않다. 미국이 어떤 제안을 하든 우리로선 하나같이 풀기 쉽지 않은 문제일 공산이 크다.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 등 민감한 사안이 두루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도 촉박하다. 한미는 미국이 25%의 상호관세 부과를 유예한 7월 8일 이전까지 협상을 타결하기로 기본 합의를 했다. 이번 2차 기술 협의 이후 다시 양측이 다시 만나는 시점은 6월 중순으로 훌쩍 넘어간다. 이른바 '줄라이패키지'를 타결하기에 만만치 않은 시간이다.
어떻게 봐도 대단히 불리한 상황이다. 그런데 일각에선 정부가 왜 이렇게 협상을 서두르냐는 지적이 나온다. 새 정부가 주도적으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시간을 늦추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8개국과 동시에 관세 협상을 벌이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지적이다. 트럼프는 협상 대상국에 서두를 것을 연일 종용하고 있다.
어느 정권이 협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결과를 만드느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협상이 잘 풀리면 어차피 공은 차기 정부에 넘어간다.
통상 당국은 차기 정부에 최상의 협상 조건을 넘겨주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정치권은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며 최상의 지원 방안을 찾고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