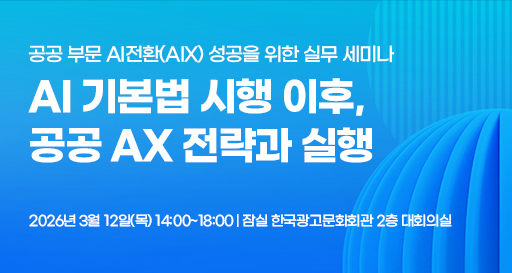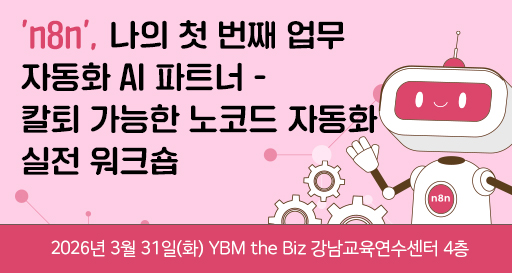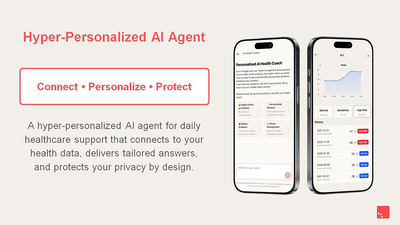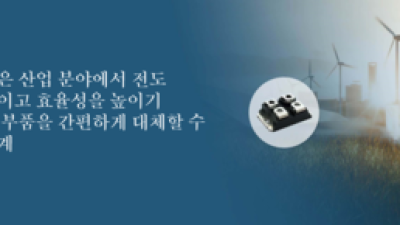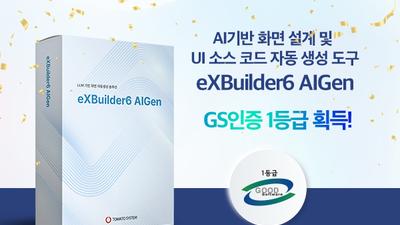앤쓰로픽의 MCP(Model Context Protocol)가 업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다. MCP는 대규모언어모델(LLM)을 포함한 다양한 인공지능(AI) 모델이 외부 데이터나 업무 도구와 손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표준화된 개방형 기술 규약이다. MCP는 다양한 장비를 연결하는 'USB 포트'처럼 AI 세계에서 모델과 도구를 잇는 연결 표준이라 할 수 있다.
업계가 MCP의 등장에 열광하는 이유는 과거 HTML이라는 표준 프로토콜을 통해 인터넷이 급격히 확산된 것처럼 MCP가 AI와 데이터를 연계하는 표준으로 자리잡을 경우 AI가 더 빠른 속도로 파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오픈AI는 경쟁사인 앤쓰로픽의 MCP를 자사 AI 에이전트의 통신 표준으로 채택했다. 오픈AI는 자사의 에이전트 SDK(Agents SDK)에서 MCP를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향후 챗GPT 데스크톱 앱과 응답 API(Responses API)에도 MCP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일찌감치 MCP 지원을 결정하고, 공식 C# SDK를 출시했다. 이외에도 AWS, 깃허브, 블록, 아폴로, 리플릿 등 많은 기업들이 자체 플랫폼에 MCP를 추가했다. 불과 몇 주만에 MCP는 AI 모델과 시스템 간 연계를 지원하는 기술표준으로 자리잡았다.
현재까지는 AI 모델을 업무 시스템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스템 통합 작업이 필수였다. 그러나 MCP와 같은 표준 프로토콜이 보급된다면 AI 모델과 외부 데이터, 앱 간 연동은 훨씬 쉬워진다. AI 모델이 외부 도구와 자유롭게 연결될 수 있어야 나만의 비서 역할을 수행하는 에이전틱 AI의 확산도 본격화될 수 있다.
우리는 MCP와 같은 개방형 표준의 등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더 나아가 우리가 만든 기술이 국제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실제 많은 사례들이 국제 표준을 선점한 기업이 세계 시장을 지배하게 된 과정을 잘 보여준다.
역사적 사실은 기술 표준화와 호환성의 중요성을 뒷받침한다. 전국(戰國)시대 이후 진(秦) 나라가 중국 최초의 통일 왕조를 수립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석궁과 바퀴의 규격을 통일한 표준화 전략이 크게 작용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후 진시황은 도량형은 물론 문자와 서체까지 표준화하며 제국의 통일성을 강화했다. 근대로 오면 총기 제작자 사무엘 콜트(Samuel Colt)가 총기와 총탄의 표준화와 호환성을 통해 리볼버(Revolver)와 콜트(Colt) 권총의 성공을 이뤄냈다.
오늘날 마이크로소프트(MS), 애플(Apple), 인텔(Intel)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윈도(Windows), 아이폰(iPhone), 중앙처리장치(CPU)와 같이 전세계인이 사용하는 범용적인 제품을 만들어 스스로 규칙을 만드는 기업(rule maker)으로 자리매김했기에 시장을 선도할 수 있었다.
국내에서도 국제 표준을 선도함으로써 시장점유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사례가 존재한다. 과거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개발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s) 기술이 국제 디스플레이 표준으로 채택되면서 세계 OLED 시장의 95%를 장악했던 사례가 있다. 국내 기업이 개발한 맵 앱 주행방식의 로봇청소기가 국제표준(IEC62929)으로 채택되면서 시장점유율이 급상승한 사례도 있다.
반면에 기술 표준화를 이루지 못해 사고와 손실이 발생한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 예전 지하철 4호선 남태령역과 선바위역 사이엔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마(魔)의 구간'이라 불리던 위험 구간이 존재했다. 이는 당시 서울지하철공사 관할구간은 우측통행과 직류 1500V를, 철도청 관할구간은 좌측통행과 교류 2만5000V를 사용했기에 벌어진 일이었다. 표준화 실패로 인해 4호선이 개통된 1995년에는 10여일간 무려 22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다.
1980년대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초소형 4mm 캠코더를 개발했지만, 소니의 8mm 캠코더가 국제표준으로 채택됨에 따라 삼성의 신제품은 우수한 기술력에도,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한 바 있다.
이외에도 1970년대 비디오 재생방식을 둘러싼 VHS와 베타(β-MAX) 방식 간 표준 전쟁은 유명한 일화다. 소니의 베타 방식은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었으나, 기술 공개를 통한 호환성 확보 전략을 구사한 마쓰시타의 VHS 방식이 세계 표준으로 채택됨에 따라 마쓰시타는 연 2조원 이상의 로열티 수입을 거둘 수 있었다.
최근 많은 국가들이 AI를 비롯해 소형모듈원전(SMR; Small Modular Reactor), 자율주행 등의 영역에서 기술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물밑 경쟁을 마다하지 않는 것은 기술표준 경쟁의 우위가 곧 국가적 실익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수장으로 한국인이 선출되어 취임한 것은 기술표준 경쟁에서 중요한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AI 표준화를 선점해 기술 주권과 국가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한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은 투자인 AI 표준화와 호환성 확보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황보현우 서울대 산업공학과 객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