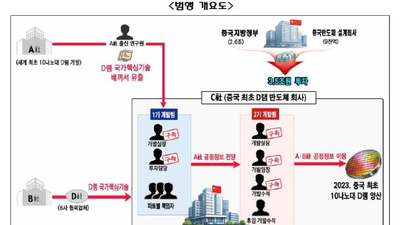'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분류체계(KCD)로 도입하려는 정책이 추진되면서 업계와 학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한 이후 국내에서도 국제질병분류(ICD-11)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게임업계와 문화계, 정치권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게임을 중독물질이자 질병으로 규정하는 시도가 창작 활동과 산업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관련기사 14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이 여가이자 문화콘텐츠인 점을 들어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 없이 질병코드를 도입하는 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민관협의체에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의료계와 산업계 간 입장차는 여전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문화재단은 현장 경험과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과잉의료화와 사회적 낙인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치권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는 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명확히 했다. 이를 위한 통계법 개정과 정책 로드맵 마련에도 착수했다. 게임에 익숙한 학부모 세대가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정치권 내 균형 있는 논의가 가능하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황희두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장은 “특위 내에도 질병코드 대응 분과를 별도로 운영 중”이라며 “앞으로 학부모 인식 개선을 위한 공공 캠페인, 국회 토론회 정례화 등을 통해 여야와 협력하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는 게임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행위가 표현의 자유, 여가 자기결정권 등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국내 법령상 이를 전면 수용해야 할 의무도 없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자신문은 질병코드 도입을 둘러싼 복잡한 논의 구조와 사회적 우려를 진단하기 위해 관계 부처, 정책 당국, 법조계, 현장 전문가가 참석한 좌담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