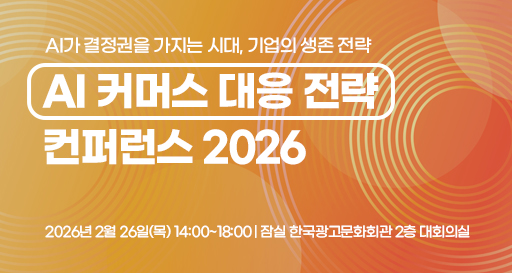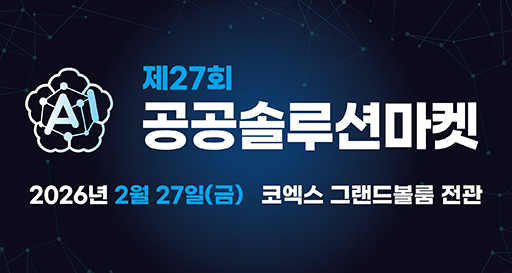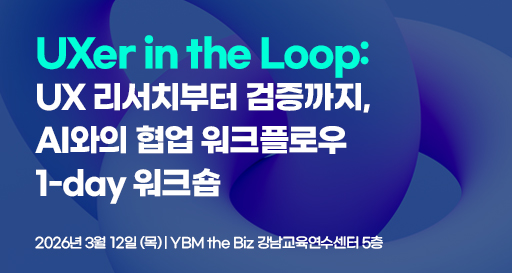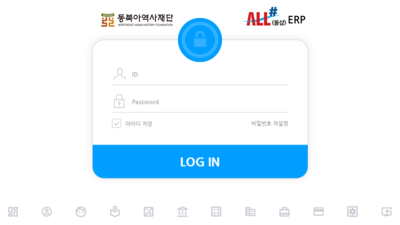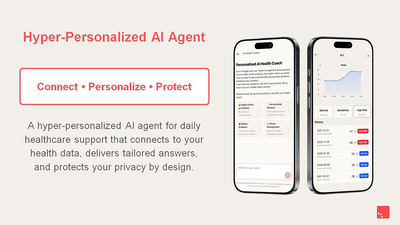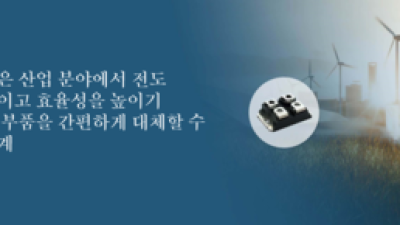지난해 보건복지부 장애인 건강권 보장 정책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병원과 연계한 재활복지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복지부는 의료 전문가와 장애인 당사자 의견을 수렴해 올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주요 정책부문 자체평가 결과에서 장애인 건강권 보장·의료 접근성 제고 사업은 총 15개 부진 사업 명단에 올랐다.
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권 향상을 위해 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보건소를 연계한 의료·복지 통합건강보건관리 사업, 장애친화 산부인과, 건강주치의, 권역별 재활병원 등을 펼치고 있다. 서울 관악구 등 16개 보건소를 멘토보건소로 지정해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우수 사례를 확산하고, 장애친화보건소는 2023년 8개소에서 지난해 10개소로 확대했다. 권역재활병원은 7개소를 운영 중인 가운데 충청남도와 전북특별자치도에 추가로 건설하고 있다.
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권·의료접근성 사업이 관련 병원과 충분히 협의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장애인 주치의 사업도 이용자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주치의 797명이 장애인 6696명을 담당했는데, 기존 중증에서 경증까지 지원 대상과 횟수가 늘어나는 것을 고려하면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복지부는 4일 장애인 건강 정책 포럼을 열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선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와 의료기관 개편 방안을 중점으로 다뤘다. 복지부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이동지원, 일상 건강관리 지원 등을 주제로 올해 총 6차례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건강권 보장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요소”라면서 “현장 목소리를 기반으로 장애인 건강권 향상에 기여하는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