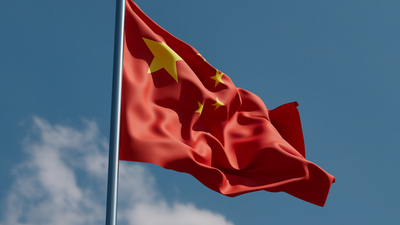전(前) 공정·후(後) 공정이라는 말이 있다. 50여년간 한국 반도체 산업을 둘로 가르는 경계선이다. 쉽게 풀면 전 공정은 웨이퍼에 회로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후 공정은 이렇게 만들어진 반도체를 검사하고 최종 칩(패키징)으로 완성하는 단계다.
지금까지 후공정은 반도체를 보호하고 기판과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노동집약적 산업인데, 메모리 중심 반도체에 주력했던 우리나라는 그 성향이 더욱 짙다. 쏟아지는 메모리를 패키징하려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만으로는 감당이 어려워, 전문 패키징 업체에 물량을 넘겨왔다. '외주반도체패키징테스트전문기업(OSAT)'들이다.
국내 OSAT 성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좌우됐다. 반도체 제조사의 외주 물량이 많아야 OSAT의 일거리도 늘기 때문이다. 사실상 하도급 구조다. 생태계가 이렇다보니 국내 반도체 패키징은 언제나 산업의 사각지대였다. 공정의 전·후를 나누듯 그 중요성이 뒤처진 것이다.
시대가 변했다. '무어의 법칙'에 맞춰 반도체 성능(집적도)은 계속 좋아져야하는데, 전 공정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했다. 기술 난도가 높아졌고 동시에 비용도 급증해서다.
답을 찾는 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반도체 회로를 미세화하는 게 어렵다면 다른 방식으로 성능을 끌어올리면 됐다. 최근 2.5D·3D라고 불리는 '첨단 패키징'을 통해서다. 세계 반도체 시장은 첨단 패키징에 집중 투자했다. 그 성과 중 하나가 인공지능(AI) 가속기를 구현하는 2.5D 패키징이다. AI 시대에 엔비디아를 일약 스타로 만든 주요 기술이다.
첨단 패키징의 파급력은 국내에도 큰 변화를 줬다. 패키징 업계에서도 “이렇게까지 패키징이 주목받은 적이 있었나 싶다”며 놀라워할 정도다. 앞다퉈 첨단 패키징을 신성장동력으로 낙점하고 먹거리 발굴에 나섰다.
그러나 뿌리 깊은 '후(後)'자의 족쇄를 푸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국내 첨단 패키징 주도권은 여전히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쥐고 OSAT는 눈치만 보는 상황이다. 그 사이에 대만 ASE·미국 앰코·중국 JCET 등 글로벌 OSAT는 2.5D·3D 패키징 기술을 확보, 시장을 공략 중이다. 세계 10위 OSAT 중 국내 업체는 하나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고, AI 메모리로 급부상한 HBM을 패키징하는 국내 OSAT는 아직 전무하다.
문제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조차도 2.5D·3D 등 첨단 패키징 패권을 쥐지 못했다는 것이다.TSMC가 구축한 대만 첨단 패키징 생태계에 한참 밀린 상황이다. 대만과 한국 패키징 생태계 경쟁력은 10년 격차라는 말도 들린다. 패키징 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첨단 패키징이 급부상했지만 여전히 한국 반도체 산업에서는 후순위”라며 “삼성전자에서도 패키징은 아직 한직이라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각광받는 첨단 패키징 중 '칩렛'이 있다. 서로 다른 반도체를 연결, 성능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단순 패키징의 영역만은 아니다. 반도체 간 연결 기술(인터커넥트) 때문에 '설계'부터 칩렛을 고려해야한다. 전 공정 뿐 아니라 반도체 개발 초기 단계부터 패키징 기술이 녹아든 것이다.
이제 전 공정과 후 공정의 경계는 무너졌다. 기술의 전후나 상대적 중요성을 따져서는 반도체 시장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다. 설계든, 전공정·후공정이든 상호 협력만이 여러 기술 난제를 풀고 반도체 경쟁력을 키울 방법이다. 이제 후(後)공정은 없다. 바야흐로 융합의 시대다.
권동준 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