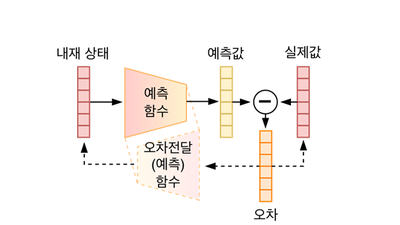통신서비스가 임계점을 넘어 자생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네트워크 부설과 적기의 단말기 보급, 그리고 적절한 요금 수준 구현은 필수조건이다. 1970년대 경제가 성장하면서 부의 상징이었던 집 전화 수요가 늘어났지만, 전화기가 제때 공급되지 못해 수요 적체가 심각했다. 사재기·임대업이 번성했고 시세조작도 이루어졌다. 전화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백색 전화' 한 대 값이 500만원 안팎 하던 서울 일반주택가의 5분의 1을 넘었었다. 배경이 없어 전화기를 먼저 받아내지 못하면 사회적으로 무능한 자로 여겨지기도 했다. 전화 적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자 1970년 9월, 정부는 사용권 양도를 막고 청약 순으로 집 전화를 제공하는 '청색 전화' 제도를 도입했다. 깨끗한 전화라는 의미일지 싶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었다.
당시 정부는 너무 많은 기능을 떠안고 있었다. 정책·규제를 수립·시행하면서 전화선·전화기를 직접 부설·공급했다. 홀로 감당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컸고 예산은 경직적으로 집행됐으며 전문성이 미흡했기에 비효율적으로 운용되었다. 더군다나 규제와 사업을 동시에 수행했기에 이해관계 충돌도 우려됐다. 물론 다양한 기능을 한군데로 모아 발휘하는 것이 반드시 비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애플이 좋은 예다. 공급업체와의 협상 시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생산 전체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함으로써 고품질을 유지할 수도 있다.
정부는 1981년 12월 전화선 부설·관리 업무를 분리해 한국전기통신공사를 설립했고 정부는 정책·규제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1980년 7월에는 가입자가 단말기 시장에서 전화기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자급제'를 도입했다. 기존 가입자는 '관급제'에 따라 국가 소유의 전화기를 임대해야만 했다.
자급제를 통해 서비스·단말기의 제공·제조 기능을 분리하자 민간 제조업체가 전화기 시장에 진입했고 경쟁이 촉진되면서 전화기 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금성통신(현 LG전자)의 광고대로 '디자인과 종류 색상이 다양해 분위기에 맞는 전화기'가 제공돼 가입자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 초기에는 관급제와 병행돼 이용률이 저조했지만, 1984년부터는 전면적인 자급제로 전환했다.
무선호출기(삐삐)도 집 전화와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초기에는 네트워크·단말기 제약으로 서비스 보급이 더뎠다. 1991년 5월 옛 한국이동통신이 일괄구매해 보급하던 것을 자급제로 전환했다. 1993년 한국이동통신이 독점하던 시장에 지역사업자가 진입하면서 각기 012·015의 사업자 식별번호를 가지고 경쟁하게 됐고 지역사업자는 자급제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했다. 가입자는 최고 1500만 명에 이르렀다. 자신이 없을 때는 끌어안은 채 고민하지 말고 내려놓는 비움의 정신을 실천해야 할 때도 있다.
이내찬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nclee@hansu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