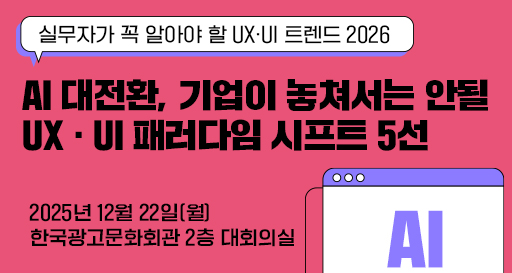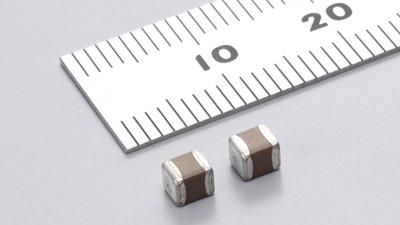약 두 달 뒤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시세조종이나 내부자정보 활용 등 생태계 발전을 저해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변경점 중 하나는 가상자산거래소에 맡긴 '고객 예치금 이자'에 관한 문제다. 현행법은 제도권 금융사 이외의 사업자가 고객 예치금에 대해 이자성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유사수신'으로 보고 제한하고 있다. 해당 규제는 1999년 1조6000억원 규모 피해액을 낸 파이낸스사의 부도가 원인이 됐다. 법 제정 이전에는 '불법자금 모집영업행위'로 처벌하던 것을, 불법자금 모집 자체를 조기에 차단하고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강화된 것이다.
유사수신의 범위를 두고 오랫동안 정부당국, 업계의 갑론을박이 이어져왔다. 핀테크 발전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신종 전자금융업·선불충전업의 등장, 가상자산사업자의 예치금 규모 확대를 불러왔는데 과거 20년 전 제정된 법이 이를 규율하기 쉽지 않았던 탓이다.
권리를 고객에게 돌려주는 이번 변화는 환영할 일이다. 사용되지 않고 쌓여있는 거래소 예치금은 매년 수조원 규모에 달한다. 금리가 낮은 자유입출금계좌에 넣어도 수백억원 이자가 생기는 자금이다.
과거 문제삼았던 유사수신과 가장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는 분야는 오히려 '상품권업'이다. 기술 발전으로 전금업과 형태상으로 거의 같아졌지만 규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영역이다. 정산주기 차이를 활용해 무제한 채권 발행, 자금 돌려막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기업 사례가 늘어나는 형편이다. 하지만 후지급 이자가 아니라 선할인 형태기 때문에 유사수신에 적용되지 않는다.
각 사례들을 보면 '무엇이 유사수신이고, 무엇이 유사수신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누구도 명확히 답을 할 수가 없다. 단순 법령 해석이 아니라 문제의 실체를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