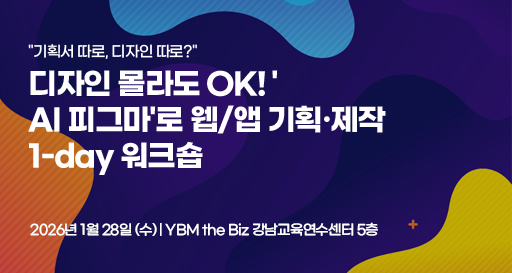태풍이 다녀가면서 조금은 더위가 가셨지만, 그 이전 한동안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날이 이어졌다. 밤낮을 가리지도 않았다. '절절 끓는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았다. 절기 상 입추와 말복이 지났어도 더위는 다시 시작돼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워낙 더우니 이런 생각도 한다. '혹시 지금이 여태껏 살면서 겪은 가장 심한 더위가 아닐까'하고 말이다.
'혹시나' 했던 것인데, 알고 보니 '역시나'였다. 우리는 현재 최악의 더위에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었다.
최근 스위스 연방의 '숲·눈·경관 연구소(WSL)'는 네이처 게재 보고서에서 '현재 지구 온도가 중세 이후 전례가 없게 높다'고 평가했다.
스칸디나비아반도 일대와 핀란드, 스코틀랜드 등지에 퍼진 소나무 188그루를 분석했다. 수령이 많게는 1200살 가까운 나이의 소나무들로, 이들 나이테 세포벽 두께 등을 측정했다. 이 방법으로 세포 형성 당시 온도와 변화폭을 가늠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탄소 안정 동위원소 분석 등 다양한 연구 방법을 더해 과학적인 당시 온도 분석이 가능하다.
연구 결과 현재 기온이 이전 시기보다 크게 높아졌다는 결론을 내렸다. 과거에 지구가 더웠던 '중세 온난기(MWP)'보다도 지금이 더 덥다는 설명이다. 중세 온난기는 서기 950~1250년 사이 유럽과 아메리카 일부 지역에서 평균 기온이 2℃ 정도 높았던 기간을 말한다.
연구진은 현재 우리가 지난 1000여년 간 역사 속에 전례 없는 온난화 시기를 겪고 있다고 역설했다. 지금이 '더위 끝판왕' 시기라는 것이다.
미항공우주국(NASA)도 지금을 최악의 시기로 봤다. NASA는 1951~1980년 6월 평균 기온을 기준으로 지구 온도변화를 분석해 왔는데, 올해 6월의 경우 기준보다 1.07℃ 높다고 발표했다.
7월도 다르지 않았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 8일, 지난달 지구 평균온도가 16.95℃로, 2019년의 7월 최고 평균온도를 0.32℃ 웃돌았다고 밝혔다. 1991~2020년 평균보다는 0.72℃ 높다고 전했다.
바다 역시 끓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는다. 지난달 세계 해수면 평균 온도는 20.96℃로, 직전 역대 최고치였던 2016년 3월 20.95℃보다 소폭이지만 높다.
바다는 대기 중 열을 식히고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바닷물이 뜨거워지면 이런 기능이 떨어진다. 게다가 빙하가 녹는 속도 역시 빨라진다. 빙하는 태양빛을 반사하는 역할도 겸한다.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면 그만큼 전체 지구온도 상승이 가속화하는 것이다.
더욱이 많은 연구자들은 이번 더위가 사상 최악으로 남을 것 같지 않다고 우려한다. 향후 더 심한 더위가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런 최악이 매해 갱신돼,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더워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원인은 역시 아직까지도 개선 여지를 보이지 않는 온실가스 배출이다.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해를 거듭할 때마다 최악을 갱신하며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시원했던 과거를 추억할 수밖에 없다.
기후학자인 개빈 슈미트 NASA 고다드우주연구소장은 “우리가 온실가스를 대기에 계속 쏟아내는 것을 멈추지 않는 한 온도는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류에게 이는 슬픈 현실이자 비관적인 전망이 아닐 수 없다.
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