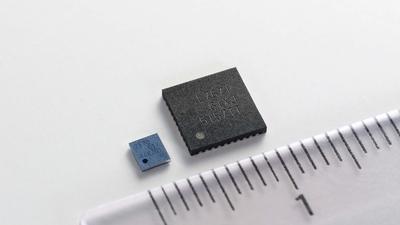의료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 개방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보건의료 데이터 개방화 지수 측정 지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표준화 체계 마련과 함께 의료기관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면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경환 서울대병원 흉부외과 교수(의료정보리더스포럼 의장)는 18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개최한 '헬스케어 빅데이터 개방화 전략 학술대회'에서 “데이터 유지관리를 병원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 표준과 플랫폼, 지원책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의료기관의 데이터 생성 노력을 존중하면서 원칙과 표준에 근거한 데이터 활용과 분석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적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데이터 기반 정밀의료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의학 연구를 비롯해 인공지능(AI) 의료기기·신약 개발 등에도 데이터 활용이 필수 요소가 됐다. 각 병원이 보유한 데이터를 정제해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헬스케어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재정이 투입된 R&D 과제에서 수집·생산하는 보건의료 데이터를 사업 종료 후 개방하도록 의무화하는 '보건의료 데이터 공유제'를 추진 중이다. 이 일환으로 의료기관 보건의료 데이터 개방 우수성을 평가하는 '보건의료 데이터 개방화 지수 측정 지표'도 개발한다.
측정 지표 개발 연구를 진행하는 이영호 가천대 교수는 “국내에서 헬스케어 빅데이터 개방과 관련된 연구는 이번이 최초”라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데이터 공유제 시발점이 되는 동시에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화 등과도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술대회에 참석한 국내 주요 병원 최고정보책임자(CIO)는 보건의료 데이터 개방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그러면서도 데이터 개방에 따른 의료기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제공된 데이터에 대한 추적 관찰이나 문제 시 회수 방안 등 후속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상오 서울아산병원 디지털정보혁신본부장(감염내과 교수)은 “헬스케어 데이터 개방이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방향성에 모두 공감할 것”이라면서도 “병원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우선 최소지표를 선정해 시범 운영하며 기준을 확대하는 접근이 필요하고 평가 지표가 의료기관 줄 세우기 자료로 비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이 데이터를 보관, 가공하고 개방 체계를 만드는데 많은 자원이 투입되는 만큼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데이터 개방에 따라 각 과정 책임을 규정하고 면책 요건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지의규 서울대병원 정보화실장(방사선종양학과 교수)은 “데이터를 개방한 병원에 모든 책임을 묻는 상황이 발생하면 의지가 꺾일 수 있다”면서 “보건의료 데이터 개방에 따라 파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사회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계에서는 보건의료 데이터 개방 움직임을 환영하면서 속도감 있는 데이터 개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재준 네이버클라우드 이사는 “산업계에서는 헬스케어 데이터 개방이 지연되다 보니 사업화 성공한 사례가 드물고 매출 발생에도 한계가 있다”면서 “코로나19 이후 산업 분위기가 성숙되는 상황에서 데이터 개방이 늦어질 경우 흐름에 역행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감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