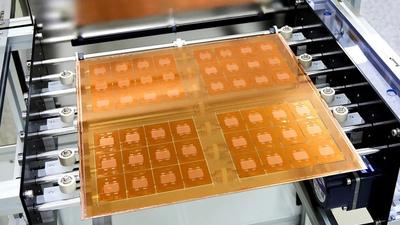진행자가 매번 산이며 외딴 곳에 사는 '자연인'을 찾아 며칠 신세를 지는 TV 프로그램이 있다. 며칠 동고동락하는 내용이다 보니 끼니 때가 빠지지 않기 마련이다. 이때면 자주 등장하는 것이 된장찌개다. 장맛 차이도 있겠지만 일반인은 상상도 못하는 이런저런 것을 자연인 처지껏 넣어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맛은 제각각일 터이다. 그러니 이것을 처음 맛보는 진행자의 그 순간 표정에 주목하게 된다.
매번은 아니지만 진행자의 얼굴에 화색이 돌고 제대로 된 맛이 나온 것 같다는 모습을 볼 때면 한편 놀라기도 하다. 기본 재료야 된장이지만 각자 처지에 흔한 재료를 넣었으니 맛이 매번 같을 리 만무하다. 그러나 대부분 필수 재료조차 없이 나름의 작품을 만들어 내고 있는 셈이다.
기업가정신만큼 혁신과 관련이 있는 것도 드물다. 그리고 흔히 기업가정신은 혁신과 신기술 동의어로 쓰이는 것도 보게 된다. 그런 탓일까. 정작 기업가정신이 필요한 곳에서 이것은 먼나라 얘기가 되기도 한다. 1인 기업이나 조그만 자영업에 혁신이나 신기술이란 잣대는 너무 거창해 보인다.
그래서 종종 혁신을 말하면서 우리는 자기당착에 빠진다. 규모를 꽤나 갖춘 기업에서나 가능한 혁신을 전가의 보도처럼 말할 때 기업가정신은 오히려 뒷자리로 밀려난다. 기업가정신을 담아 내면 충분한 그런 혁신 모습은 어떤 것일까.

여기 두 가지 사례가 있다. 첫 번째는 시네멕스(Cinemex)다. 세 명의 친구가 동업했다. 미국에서 흔하디흔한 멀티 스크린 영화관을 눈여겨봤다. 1995년에 이것을 베끼듯 멕시코시티에 가져왔다. 이름도 영화를 뜻하는 '시네'(Cine)에다 멕시코에서 '멕스'(Mex)를 가져왔다. 실상 바꾼 것도 별반 없다. 창업자의 표현을 빌리면 “멕시코를 빼면 세상 누구나 잘 알고 있던 것에다 고작 우리가 한 것은 팝콘에 버터를 잔뜩 끼얹는 대신 칠리와 라임을 얹은 것뿐이었다”였다.
산디 체슈코(Sandi Cesko)도 작은 뒤집기가 만든 성공이었다. 이즈음 동유럽엔 TV 쇼핑채널이 생기고 있었다. 이미 서유럽에서 성업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독 동유럽에서는 고전하고 있었다. 체슈코는 모든 것을 외부에 맡기는 아웃소싱이 이곳에선 안 통한다고 봤다. 체슈코는 여건이 닿는 대로 콜센터며 배달·지불 같은 서비스를 사내로 가져오기로 한다. 그리고 이 시장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한다. 결과적으로 소비자 신뢰도가 낮은 이 시장에서 체슈코의 '스튜디오 모데르나'(Studio Moderna)는 꽤나 성공했고, 서비스 표준이 된다.
이 두 사례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는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할 적기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것을 모방이라 부르는 대신 누군가는 참신한 것의 작은 불씨라고 말한다. 그리고 여기에 그 분야에서의 안목과 놀라운 실행력으로 기업가정신은 또 하나의 혁신이 된다.
요즘 예비 창업자는 새로운 뭔가를 그려 내야 한다고 느끼는 듯하다. 그리고 이것에 지친 누군가는 단념하고 잊는다. 실상 기업가정신과 혁신은 묘한 관계다. 둘은 같은 듯 하지만 구별되고, 공존하지만 어느 것도 다른 것의 전제 조건이 아니다. 어떤 것을 혁신으로 규정하든 기업가정신은 그 나름의 혁신을 정의할 수 있다.
기업가정신이 작은 착안과 열정이 담긴 실천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런 혁신은 얼마든 있다. 그러니 혁신의 가장 큰 걸림돌은 혁신을 거창하게 보는 것인지도 모른다.

박재민 건국대 기술경영학과 교수 jpark@konku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