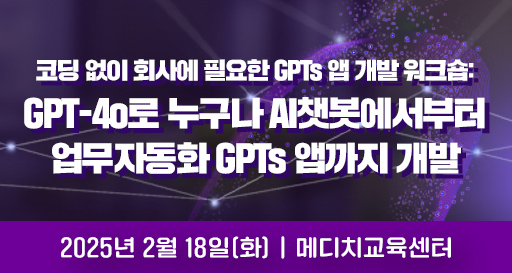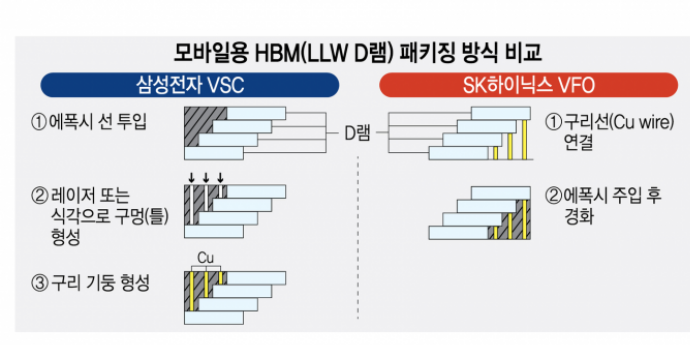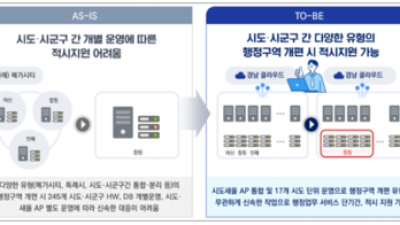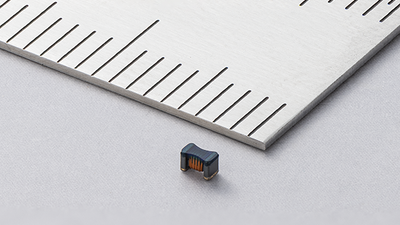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 의견 대립이 좀처럼 좁아지지 않는 모양새다. 가장 첨예하게 맞선 빅테크 내부거래 외부청산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위원들 사이에서도 딱히 한쪽으로 의견이 모이지 않고 있다.

금융 당국과 업계 간 시각차도 존재한다. 빅테크는 기존 금융권으로 진입하지 않고 여러 사업 중 하나로 금융 비즈니스를 할 것이라는 금융 당국 시각과 빅테크가 더 힘을 키워서 금융권에 진입한 것과 동일한 파급력을 갖출 것이라는 업계 시각이 대치한다.
금융 당국은 빅테크가 온전히 금융권에 진입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권보다 낮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면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업 모델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에 비해 비교적 강도 높은 규제를 받는 금융사는 뛰놀 수 있는 마당이 좁다고 하소연한다. 금융사가 오랫동안 구축해 놓은 사용자 기반을 빅테크와 공유하고 있지만 정작 빅테크로부터 받는 이점은 제한적이라고 억울해 한다.
전자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핵심 논쟁 중 '동일 기능 동일 규제' 문제가 팽팽히 맞설 수밖에 없는 이유다.
사실 빅테크 내부거래 외부청산 논쟁의 경우 정작 빅테크 입장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다. 소비자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면 규제는 감수하겠다고 한다. 결국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쪽과 불가피한 변화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쪽의 대립이 기득권 다툼으로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금법 개정안 논란이 길어지면서 금융소비자는 보호장치가 마땅치 않은 빅테크에 대한 규제 환경을 알게 됐다. 개정안 통과가 늦어지면 새로운 금융서비스 모델의 출현도 늦어지고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도 미뤄질 수 있다. 그렇다고 '일단 통과'를 외치기에는 짚어야 할 쟁점이 많다. 부디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보다는 금융사와 빅테크 간 역차별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새로운 금융 환경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무엇인지 제대로 담은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