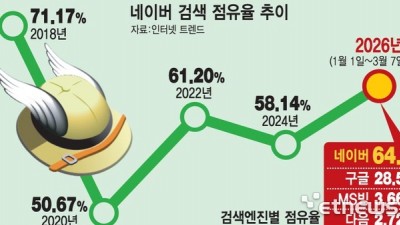中 저가공세 밀려 폴리실리콘 등 수출 급감
업계 "만들수록 적자"…사업 철수 잇따라
국산 사용 확대 등 밸류체인 보호정책 시급

폴리실리콘에서 잉곳·웨이퍼로 이어지는 태양광소재 부문은 이미 중국 기업에 잠식당했다. 국내 일부 소재 기업은 사업을 이미 철수했거나 고사 위기에 처했다. 그나마 웨이퍼 다음 단계인 태양광 셀 부문에서 국내 기업이 중국과 힘겨운 경쟁을 벌이고 있다.
태양광업계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폴리실리콘 수출액은 1억달러로 전년 대비 72.3% 급감했다. 폴리실리콘 수출액은 지속 감소했다. 2017년 10억3300만달러에 이르던 것이 이듬해 7억4700만달러까지 내렸고, 2019년에는 4억7600만달러에 그쳤다. 불과 3년 만에 수출액이 절반 넘게 쪼그라들었다.
폴리실리콘 수출이 급감한 것은 대표 폴리실리콘 생산기업 OCI가 국내 폴리실리콘 공장 가동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값싼 중국산 범람에 시장에서 도태됐다. 중국은 세계 폴리실리콘 소비의 90%를 넘게 차지한다. 대규모 증설과 공장가동률 조정 등을 통해 폴리실리콘 가격을 좌우하고 있다.
다른 태양광 소재도 상황은 비슷하다. 폴리실리콘을 가공해 만드는 잉곳 수출액은 2020년 10월 누적 기준 80만 달러로 전년 640만 달러 대비 87.4% 감소했다. 폴리실리콘과 마찬가지로 가격경쟁력 하락에 직격탄을 맞았다. 한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잉곳의 경우 생산원가가 판매 시세에 못 미쳤다”면서 “적자가 누적되는 원가 구조 때문에 잉곳 업체들은 사업을 영위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중국산 태양광 소재는 시장 지배력을 높이고 있다. 2019년 기준 글로벌 톱 10 기업 시장점유율은 폴리실리콘 88%, 잉곳 92%, 웨이퍼 83%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국 시장 점유율은 폴리실리콘 64%, 잉곳과 웨이퍼 각각 92% 수준이다. 중국산이 세계 태양광 시장을 선도하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로 이어지는 태양광 소재 밸류체인을 지켜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국산 소재 공급이 중단될 경우 우리나라 태양광 셀과 모듈 생산이 멈춰설 수 있는데다,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태양광 소재 밸류체인에서 살아남은 국내 기업이 극소수”라면서 “국내 태양광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산 소재 사용 확대 등 성장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