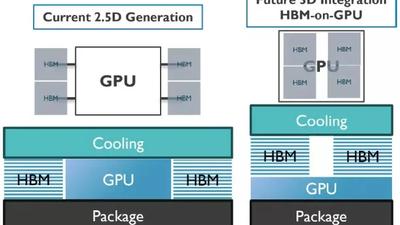지난 4일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대상으로 수출 규제를 시작한 데 이어 자동차와 화학 분야 규제까지 준비하면서 국내 완성차 및 부품 업계에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공모 기간을 거쳐 8월 20일께 시행되는 만큼 '2차 보복'은 사실상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과거에 미쓰비시·닛산 등 일본 완성차 업체들로부터 차체 제작 기술을 배웠고, 부품 역시 일본산 비중이 높았다. 이로 말미암아 공장 형태부터 시장 트렌드(흐름)까지 일본과 비슷한 모습이었다. 시장은 이제 미국이나 유럽 영향을 더 많이 받지만 여전히 부품업계에서는 덴소, 아이신,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 부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동차 업체들은 현재 일본산 주력 부품, 원자재 등에 관해 파악하는 한편 대안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부품을 현대모비스, 만도를 통해 국산화했거나 미국·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도 공급받고 있다. 특히 파워트레인(동력 계통)의 경우 직접 또는 계열사를 통해 내재화했다. 그러나 쌍용차, 르노삼성차는 상황이 다르다. 일본 아이신, 자트코 등으로부터 변속기를 공급받고 있다. 일본 정부가 부품 수출 규제를 시작하면 수요·공급 문제로 생산이 계획대로 되기 어렵다. 이는 간신히 정상화 단계를 밟고 있는 기업에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첨단 센서, 카메라 등 일본 부품이 필요로 하는 모듈 공급에 비상이 걸렸다. 미래 기술로 분류되는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부품의 경우 일본 의존도가 다른 부품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친환경차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화학 업체들은 배터리셀 원재료나 배터리팩 구성 부품 재고를 파악하고 있다. 국내 기업도 찾고 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은 완성차, 부품업계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다. 내수 시장은 180만대 수준에서 몇 년째 정체됐고, 수출은 6년째 감소했다. 자동차 생산 대수는 2011년(466만대)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2016년 글로벌 '빅5' 자리에서 내려왔다. 지난해에는 멕시코에까지 추월 당해 7위로 내려앉았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자동차 수출 규제까지 겹치게 되면 400만대 생산도 깨질 수 있는 상황이다.
부품업계 상황은 더욱 참담하다. 9000여개의 부품사 가운데 2013년 898개에 이르던 1차 협력사는 지난해 831개로 67개사가 줄었다. 지난해에만 20개사가 사라졌다. 2014년 78조원에 이르던 부품사의 매출액은 2018년 71조원으로 약 10%(7조원) 줄었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은 7일 이 같은 상황에서 일본이 자동차 관련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국내 자동차 산업에 큰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 회장은 “우리에 대한 부품소재 수출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면서 “특히 규제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생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강화 등 민·관 협조가 긴밀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단순히 산업계뿐만 아니라 정부의 협조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내 자동차 산업은 탄탄한 거미줄 구조의 서플라이체인(공급망)을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한 단계 내려가서 보면 일본이라는 큰 공급처가 '펑크'를 내면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완성차 업체와 1차 협력사는 대기업 중심이기 때문에 당장에 큰 위기는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2·3차 협력사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이기에 선제 조치가 없으면 사라질 수도 있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