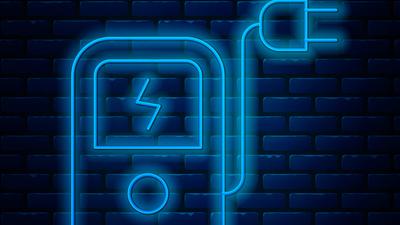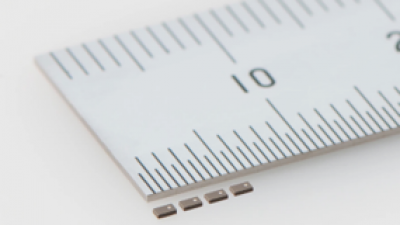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중기간경쟁제품) 제도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3D프린터와 에너지저장장치(ESS)처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미래 성장동력 산업이 지정 대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과거에도 발광다이오드(LED)와 센서 등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산업 발전을 저해했던 경험이 있다. 때문에 중기간경쟁제품 선정 시 산업 성장 가능성과 중소기업 역량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중기간경쟁제품으로 지정을 추진하는 품목 중 논란이 되는 것은 3D프린터와 ESS 등이다.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산업이자, 이제 막 시장이 확대되기 시작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논란이 일어나는 이유는 많은 국내 기업이 참여해 글로벌 기업과 경쟁해야 할 시기에 국내 시장에 대기업과 중견기업 참여를 제한하려는데 있다. 중소기업만으로는 시장 확대와 글로벌 시장 대응에 한계가 있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관계자는 “ESS는 고가 제품으로 정부 주도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정책적 확대가 필요한 시장”이라면서 “현재 적용하는 피크 저감에 대한 ESS 활용 부분에 있어서도 경제성 확보 및 ESS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술 역량도 논란이다. 중소기업이 해당 산업을 주도하기에는 기술적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ESS가 장기간 유지보수가 필요한 전력계통 산업으로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1년 2개월 동안 발생한 ESS 화재·폭발사고가 10건에 달할 정도로 안전성과 신뢰성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 ESS를 중기간경쟁제품으로 신청한 중소기업들은 시스템통합(SI) 역할을 통해 ESS를 구축하겠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업계는 회의적이다.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을 SI 업체가 개발·제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의견이다.
3D 프린터 역시 중기간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경쟁력이 더 약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국내 중소기업이 적층융합제조방식(FDM)을 넘어 다양한 산업용 3D 프린터까지 하기에는 역량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이제 막 신산업으로 커 나가는 3D프린팅 산업을 규제하면 역효과가 생길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중소기업 보호에 매몰돼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로 떠오른 3D 프린팅 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중기간경쟁제품으로 지정된 드론 역시 지정 효과에 대해 계속 의문부호가 남는다. 공공시장에서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더 이상 시장 확대가 불가능한 한계도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이 참여해 시장을 키우는 것이 불가능해지면서 향후에도 제한적인 공공시장을 중소기업이 나눠 갖는데 그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 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중기간경쟁제품 지정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에서는 중소기업 보호라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산업 발전 저해라는 역효과를 줄이기 위해 품목 지정 과정을 보다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기간경쟁제품 지정·추천 신청접수를 받고 접수된 품목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 조정회의를 갖는다. 하지만 양측 이해관계가 첨예한 경우 조율이 쉽지 않다. 중기중앙회 권한이 제한적이어서 적극적인 중재가 어렵다. 양측 의견을 취합해서 중기부에 전달하는 구조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열리는 조정회의는 양측 주장이 팽팽해서 조율보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면서 “ESS 경우도 중소기업 의견이 많이 반영돼 중기부로 지정품목 의견이 건의됐다”고 아쉬워했다.
향후 중기부가 진행하는 부처 간 업무협의에서도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단순히 양측 의견을 절충해 결정하기보다는 국가와 산업 차원에서 논의해 지정 여부부터 적용 범위까지 정교한 작업이 요구된다.
권건호 전자산업 전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