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권을 포함해 여러 산업에서 기업이 디지털전략팀을 신설하고 있다. 2010년대 초·중반에 미국과 유럽에서는 최고 디지털전략책임자(CDO)의 인기가 높았다. 이와 비교하면 철이 지난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다.
디지털전략팀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또는 디지털 변혁 대응 및 선도를 목표로 한다. 디지털 변혁에 대해 일부 컨설팅 회사는 고객 경험, 비즈니스 모델 및 업무 프로세스의 디지털 변혁으로 정의한다. 여기에 더해 필자를 포함한 일부 학자와 실무가는 정치·경제·사회 변혁까지로 그 의미를 확장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3D 프린팅,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이 디지털 변혁의 촉매 기술이다. 이들은 모두 범용 기술이며, 동시에 디지털 기술이다.
디지털 변혁은 비즈니스와 정보기술(IT)을 용합시켜 하나로 만든다. 과거의 전통 전략에서 벗어나 디지털 전략이 필요한 배경이다.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기업과 조직은 없을 것으로 본다.
기업의 디지털전략팀 구성과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인력 구성을 IT 전문가 중심으로 하거나 현업 인력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을 통합 구성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디지털 전략이 비즈니스와 IT의 통합, 융합 전략임을 고려한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구성 방식이다.
운영 형태는 더욱 흥미롭다. 디지털 전략을 위한 기획은 현업 인력이 하고, 그 구현은 IT 조직이 한다. 현업은 제한없는 상상력으로 디지털 변혁 요건을 제시한다. 구현은 묵묵한 IT 조직에 일임한다. 이는 과거의 비즈니스 전략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IT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던 모습과 다르지 않다. 다만 활용하는 기술만 다르게 보일 따름이다. 그 결과 기술 타당성과 비즈니스 상상력은 융합되지 않고 유리되며, 고립된다. 그러다 보니 디지털 전략은 진척되지 않고 도돌이표가 되고 있다.
이야기를 좀 더 구체화하자. 데이터 표준화도 하지 않은 기업이 빅데이터를 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다. 블록체인의 경우 잠재성은 높지만 기술 문제, 쓰임새 및 생태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비트코인류의 대박을 꿈꿀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
그리고 빅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AI를 하겠다고 주장한다. 대부분 조직에서 디지털 전략은 판박이같이 유사하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 디지털 전략이 어느새 단순 '패스트팔로어' 전략으로 전락했음을 알 수 있다.
전 세계에 걸쳐 CDO 증가 추세가 2010년 중반 들어 주춤한 이유는 모든 조직이 디지털 전략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디지털 전략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의미다. 이는 조직의 디지털 역량이 핵심으로 됐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기업의 디지털 전략 가운데 디지털 역량 및 디지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협상과 협조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과제는 찾기 어렵다.
“문화는 전략을 아침거리로 먹어치운다”는 말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의 디지털 전략은 조직 문화의 아침거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짙다. 적어도 지금의 운영 실태로 본다면 당분간은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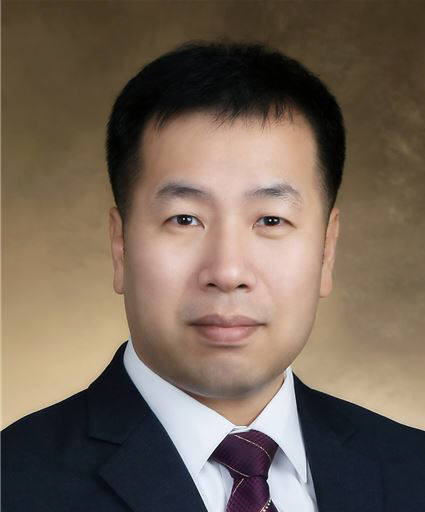
윤기영 FnS컨설팅 미래전략연구소장 synsaje@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