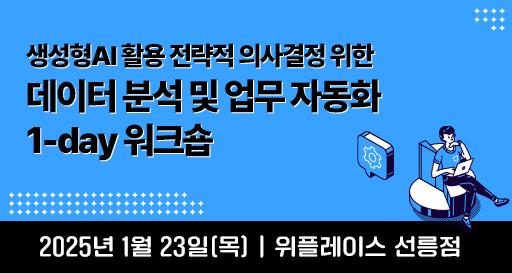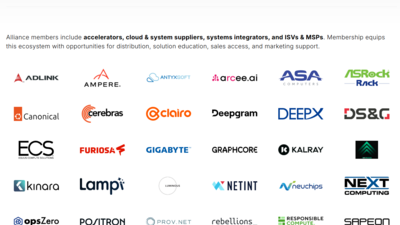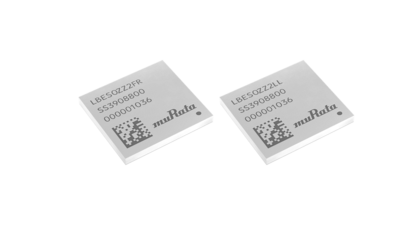19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15일을 남겨두고 있다. 쫓기듯 치러지는 상황 속에 국민 마음도 불안하다. 어떤 후보가 대한민국 난국을 극복해 나가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줄지 확신이 잘 서지 않는다.
2주일여 앞두고 TV토론이 5차례 진행된다. 미디어 다변화로 TV토론 영향력이 예전보다 떨어졌다는 평가도 있지만 앞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볼 수 있듯이 여전히 국민적 관심도는 높다.

TV 토론은 후보자들이 다수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특히 지금처럼 한 자릿수 지지율 차이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선거 판세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방송으로 토론회를 직접 시청하지 않더라도 당시에 언급된 이슈나 후보들의 생각은 연일 화제가 되어 뉴스로 확대·재생산된다. 특히 남은 토론회는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만큼 승부를 가르는 '결정적 한 방'이 될 수 있다.
미 대선에선 대부분 TV토론 승자가 대통령 선거 최종 승자였다. 196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정치신예 존 F 케네디 후보가 경륜 있는 달변가 리처드 닉슨 후보를 '자신감'으로 이겼다. 지치고 피곤한 기색의 닉슨보다 훨씬 건강하고 자신감에 찬 이미지로 “미국은 훌륭한 나라지만 더 훌륭하게 만들 수 있다”고 호소했다. 케네디의 한 마디는 유권자 마음을 빼앗았고 판세를 뒤집었다.
그러나 너무 자신감에 찬 모습은 오히려 역효과일 수 있다. 앨 고어는 TV토론에서 상대 후보인 부시를 무시하고 놀리듯이 질문해 인격이 야비하다고 비춰지면서 역전이 일어나기도 했다.
생각보다 TV토론은 단순하지 않다. 자신이 준비한 내용을 암기해서 학예발표회처럼 일방적으로 읽기만 해선 안 된다. 그렇다고 화려한 언변으로만 평가되지도 않는다. 최근 치러진 미 대선에서 클린턴은 토론회에서 항상 우세했다. 하지만 트럼프가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에 집중공세한데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서 치명타를 입었다.
토론회는 1위 후보에겐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다. 반면에 뒤지고 있는 후보에게 역전극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그만큼 후보에게 TV 토론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무대다. 개개인의 경쟁력을 어필하는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이끌어야 한다. '불통'으로 무너진 정치권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후보들은 토론회를 통해 보여줘야 한다. 투표할 후보가 없다고 생각하는 많은 유권자의 마음을 울리고 감동시키는 자가 결국 TV토론의 챔피언이 될 것이고, 청와대로 향할 수 있을 것이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