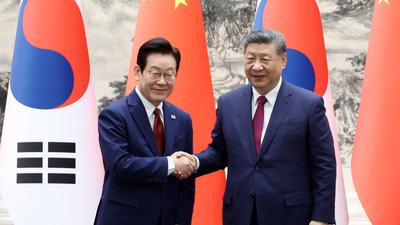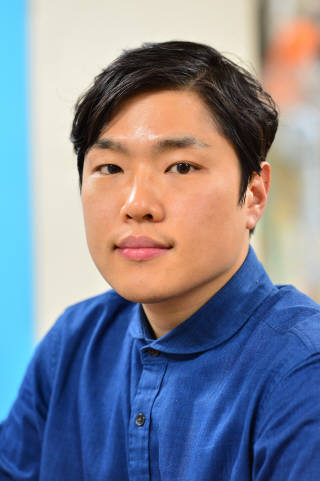
“이 게임을 만들게 된 계기가 뭐죠?” “마음이 아픈 사람을 위해 대화 상대를 만들어 봤습니다.”
2년 동안 분기마다 우수한 게임을 뽑는 심사를 했다.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만든 게임부터 대학을 졸업하고 자취방에서 만든 게임까지 접수된 작품이 다양하다. 출신은 제각각이지만 하나 같이 자기 자식 다루듯 게임을 꺼내놓는다. 인정받을 때까지 도전하겠다는 지원자도 종종 나온다.
자기를 알려야 하는 자리에 서면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한다. “나는 왜 게임을 만드는가?” 답은 조금씩 다르지만 내가 만든 결과물이 대중에게 사랑받길 원하는 마음은 누구나 같다. 초심이다.
심사를 반복하다 보면 게임을 과연 매출 등 숫자로만 평가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의문이 든다.
게임은 종합 예술 성격이 짙다.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붙여야 한다. 개발자가 의도한 대로 이용자가 콘텐츠를 즐기도록 모든 과정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게임성을 평가하는 핵심 요소의 하나가 '창작'인 이유다.
국내 게임 산업은 20년 역사를 쌓았다. 게임을 백안시하는 분위기가 여전하지만 누구나 게임을 한다. 전국에 수많은 개발사와 개인 개발자가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꿈을 꾸며 게임을 만든다.
게임업계는 최근 자아비판을 겪고 있다. 모바일게임 시대로 접어들면서 너무 양산형 게임을 만드는 데 치중하지 않았느냐는 반성이 내부에서 나온다. 1세대들이 나서서 “게임을 만드는 본질을 생각해 보자”고 말한다. 산업이 발전하며 초심을 잃지 않았는지 되돌아보자는 경고다.
사행성 이슈가 불거진 '확률형 아이템'을 없애거나 부작용을 개선한 시스템을 선보인 회사도 나왔다. 이런 현상을 두고 한 개발자는 “이용자 비판도 무섭지만 어릴 적부터 꿈꿔 오던 일에 불순한 의도가 끼어드는 것을 참기 어렵다”고 고백했다.
모든 게임업계가 이런 분위기에 동참하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옳은 일'이라는 응원이 필요하다. 창작자는 그런 격려를 먹고 성장한다.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