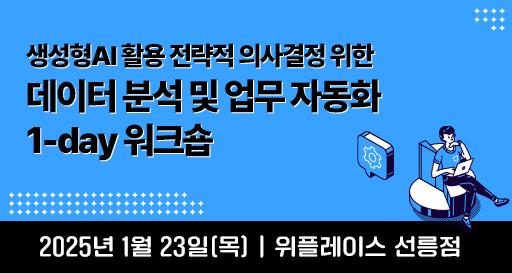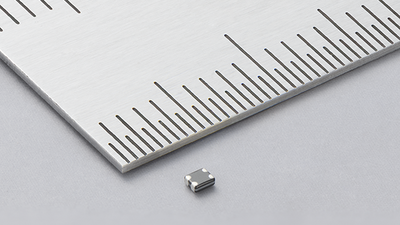1801년 조제프 마리 자카르는 새 직조기를 개발한다. 민무늬 천에 문양을 넣었다. 화려한 무늬와 함께 앞뒤의 문양이 도드라져 보였다. 나무틀 위 구멍 속으로 실이 지나가면서 문양을 놓았다. 2세기를 지난 2015년에 구글은 무늬 대신 전도체 섬유를 직물에 짜 넣는다. 움직임만으로 행동을 인식한다. 프로젝트에 `자카드`라는 이름을 붙인다.
1994년 리처드 펄드는 리먼브라더스의 최고경영자(CEO)가 된다. 기업 문화는 엉망이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었다. 동료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내 프로젝트` `내 고객` `내 수수료`.
금융 산업은 통합서비스 모델로 옮겨 갔다. 팀워크가 필수였다. 펄드는 협력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월스트리트에서 최고 가족 기업으로 탈바꿈했다고 평가받는다.
불화는 사라졌지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2007년에 상황이 나빠졌다. 경고음이 도처에서 울렸다. 하지만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았다.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았다. 어느 순간 경영진의 눈이 멀어졌다. 리먼브라더스는 2008년에 파산한다.
협력과 통합은 좋은 것이다. 상식은 그렇게 말한다. 리먼브라더스에는 왜 문제가 됐을까. 문제가 없다는 것은 항상 좋은 것인가.
사즈니콜 조니 케임브리지인터내셔널 CEO와 데이먼 바이어 전 부즈앤드컴퍼니 수석 상임고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그건 위기가 가깝다는 징조일지 모릅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리먼브라더스에서 금기 사항이었다. 뭔가 난처한 질문을 하려면 경력을 걸어야 했다. 리먼브라더스는 그런 곳이었다.
기업 경영에 조화와 협력은 중요하다. “하지만 이것만큼이나 이견과 다툼도 중요합니다.” 조니와 바이어는 세 가지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고 한다.
첫째 변화가 가치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다툼을 피하지 마라. 철도운송사 벌링턴노던은 몇 년째 배차 문제로 고민한다. 찰리 펠드 프리토레이 전 최고정보통신책임자(CIO)에게 컨설팅을 맡긴다. 첫 방문에서 충격을 받는다.
도착 시간은 늦기 일쑤였다. 심지어 기관차의 행방이 묘연하기도 했다. 방식을 뒤집어야 했다.
펠드의 제안은 논란거리가 됐다. 운영담당자의 80%가 반대했다. 이사회는 지극히 보수 입장이었고, 시스템 투자에 반대했다. 설득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서서히 복합 운송 서비스로 옮겨간다. 여전히 석탄과 옥수수를 취급했지만 토요타나 물류운송 업체 UPS 같은 고객이 생긴다. 2009년에 워런 버핏의 버크셔해서웨이가 340억달러에 인수한다. 버크셔해서웨이 역사에서 가장 큰 인수 건이었다.
둘째 미래를 위해 중요한 선택인가. 그렇다면 가치 있는 싸움이다. 롤프 클래슨은 2002년에 바이엘헬스케어의 경영을 넘겨받는다. 400억달러 규모의 인수합병(M&A)을 앞뒀다. 전임자는 이것으로 산업을 석권할 것으로 생각했다.
실상 경영진은 양분 상태였다. 문제는 미래에 있었다. 바이엘의 전략 목표와 맞지 않았다. 몇 개월 논쟁 끝에 계획을 취소한다. 2년 후 머크의 소비자 케어 부문을 대신 인수한다. 미래를 위해 더 좋았다. 선택을 미뤘기에 자금을 동원할 수 있었다.
셋째 고객에게 가치 있는 것인지 따져 보라. 더글러스 코넌트는 나비스코에서 캠벨수프 CEO로 자리를 옮겼다. 조직은 쪼개져 다투고 있었다. 품질 관리는 엉망이었다. 비용 줄이기와 단기 수익에 매몰됐다. 직원 사기는 바닥이었고, 기업은 방향을 잃었다.

코넌트는 미션부터 다시 정하기로 한다. 수익과 이윤이 중요했지만 미션을 그 앞에 뒀다. 경직된 조직을 매트릭스형으로 바꾼다. 중간관리자의 태반이 교체된다. 조직에는 긴장감이 흐른다. 서서히 조직은 혁신됐고, 2009년 다우존스가 뽑은 지속 가능 기업이 된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 보자. 협력은 왜 가치 있는 것일까. 단지 다투지 않고 평화롭기 때문일까. 아니면 정말 중요한 것에 기업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서일까.
코넌트는 자신의 방식을 `직조하기(tapestry)`라고 불렀다. 조화는 경영자에게 매력 있는 것이다. 하지만 논쟁과 이견을 그 사이에 섞어 보면 어떨까. 어쩌면 코넌트가 말하는 것도 조화와 경쟁, 이 두 가지를 조직에 짜 넣으려던 것이 아닐까. 두 번의 자카르 프로젝트가 그리 한 것처럼.
박재민 건국대 기술경영학과 교수 jpark@konku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