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해요, 안 해”. 요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행하는 말이다. 해외 게임을 하는 이들에게 자사 게임을 권하는 국내 게임사의 마케팅을 조롱하는 의미로 쓴다. 재미있는 해외 게임을 두고 굳이 한국 게임을 해야 하느냐는 뜻이다.
`안 해요, 안 해`는 해외 게임에 비해 국산 게임이 재미없다는 평가가 보편화돼 있음을 보여 준다. 여기에 “잘 만들지도 못했으면서 유료 아이템으로 현질(과도한 현금결제)을 유도한다”는 설명이 따라온다. 국내 게임사가 질 낮은 콘텐츠로 돈벌이에 몰두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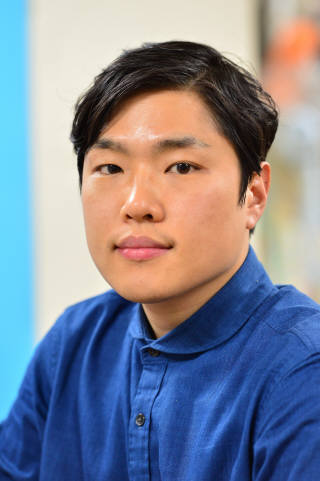
국내 게임업계는 이런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게임은 흥행 산업이다. 대중의 호응이 중요하고 상업화 성공이 콘텐츠의 가치를 결정한다. 게임은 서민의 놀이거리다.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누구나 즐길 수 있다. 이들의 평가는 단순하고, 직설적이다. 재미있는가? 값어치를 하는가?
그렇다고 `안 해요, 안 해`를 우리 게임 산업의 성적표로 받아들이면 곤란하다. 복잡한 생태계의 속내를 무시한 것은 물론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국내 게임 산업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매년 성장하고 있다. 여전히 많은 사람이 국산 게임을 즐긴다. 해외에서 호응을 받는 한국 게임도 계속 나온다.
과도한 과금 모델 주범으로 지목받는 부분유료화는 세계가 인정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한국 게임업계는 불법복제가 판치던 시절 부분유료화로 합리적 돌파구를 만들었다.
글로벌 대형 게임사들은 거대한 북미, 유럽 시장을 근거지로 하여 오랜 기간 엄청난 자본을 투입해 게임을 만든다. 체급 차이를 무시하고 우리 게임업계에 `왜 그들처럼 못 만드냐`고 질책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국회가 확률형 아이템 개별 확률 공개를 강제하는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법학자는 “게임물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맹신에서 비롯된 것이다”고 꼬집었다.
국회는 소비자가 원한다는 이유를 전면에 내세웠다. 게임업계는 자율규제를 실시하는 상황에서 토론 기회도 갖지 못했다. 제도권의 무시가 여전하다. `안 해요, 안 해` 바람이 입법부에까지 불었다면 지나친 해석일까. 취지에 공감하는 목소리에 묻힌 개정안이 어떤 `나비효과`를 불러올지 기대감보다 불안감이 든다. 논의가 부족하다. 목적지에 빨리 가는 것은 좋지만 과속은 안 된다.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