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이 주최하고 더콘테스트가 주관하는 `내가 바로 전자신문 평론가` 5월 당선작으로 정지영씨(여·명지대)가 뽑혔다. 정 씨는 `美 대법원 구글 손들어줬다` 기사와 관련해 차별화한 시각을 제시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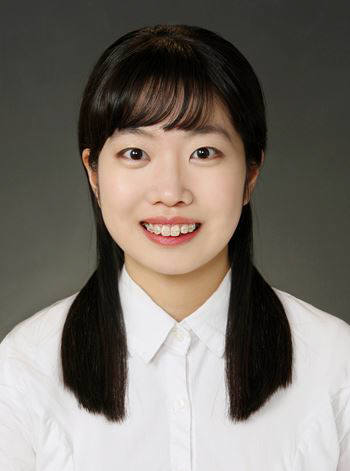
당선작 컬런 전문을 소개한다. 이 코너는 전자신문에 게재된 기사에 대해 독자 여러분이 시각을 제시하고 이를 공개 투표에 붙여 당선작을 선정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기사원문: 美 대법원 구글 손들어줬다..."도서 스캔 프로젝트 합법”
http://www.nextdaily.co.kr/news/article.html?id=20160419800064
■칼럼제목: 발전하는 기술, 권리의 범위에 도전하다 〃 구글 북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
미국에서조차 최종 판결까지 십여 년이 걸렸다. 그만큼 한순간에 받아들이긴 어려운 변화였으리라. 자신의 작품을 허가 없이 스캔한 것 자체로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작가들과 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불과하니 합법이라는 구글 사이에서 권리에 대한 선을 새로 긋는 데에는 강산이 변할 시간이 필요했다. 2016년 4월 19일(현지시각), 도서관의 책들을 스캔 및 전자화하려던 구글을 가로막던 법적 구속은 풀렸다.
계속되는 변화의 소용돌이 가운데에서는 물러서든 나아가든 움직여야 하는 시기가 필연적으로 오게 된다. 이미 오래전부터 책은 전자화되기 시작했다. 도서관과 서점에서는 작가, 출판사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원하는 책을 보여주고, 독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블로그에서 책에 대한 평가를 찾아본다. 여기에 E-book이라는 새로운 출판형태는 본문까지 전자화의 영역에 포함했다. 책의 구성 내에서는 전자화된 적이 없는 성역이 남아있지 않다. 이내 변화는 `작가의 허락 여부`라는 새로운 점령지를 찾았다. 이젠 멈출 수 없어 보인다.
잠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앵글을 당겨 거시적으로 바라보자.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연관된 권리 자체가 생겨나고, 범위가 변화하며 심지어 소멸하기까지 하는 과정은 숱하게 일어났다. 한 예로, 자신들이 발견한 특정 유전자와 관련해 특허를 받았던 이들이 있다. 이들의 권리를 무효화시키기 위하여 법적 분쟁이 일어났고, 미국은 자연 상태의 DNA는 특허를 불허하되 인조 DNA는 허가한다는 기준을 세우게 된다. 유전자를 활용할 기술이 유망주로 떠오르자 그와 관련된 권리도 재정립 혹은 재확인될 필요가 생긴 것이다.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서, 과연 구글이 정말 공적인 목표와 순수한 의도로만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보자. 그들이 비영리기관이 아닌 이상, 자신들에게 금전적으로 손해가 갈 프로젝트를 진행할 리가 없다.
우선,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여 구글에 대한 고객들의 의존도를 높일 수 있다. 다른 분야에 응용시키는 한 방법으로, 책에 쓰인 수많은 단어를 분석해 독자들의 마음과 취향을 잘 반영하는 소설을 쓰는 또 다른 AI를 만들지도 모른다.
물론 긍정적인 변화도 일어날 것이다. 화재나 테러 등에 의해 도서관이 무너져도 그 안에 있는 장서의 내용만은 훌륭하게 보존된다. 일상에서도 비슷한 소재를 다루는 책들 사이에서 하나를 골라야 할 때 독자들이 굳이 서점까지 가서 표지를 넘겨봐야 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연구자들이 참고 문헌을 찾는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책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더 많은 독자와 작가를 연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긍정적인 변화조차 이를 위해 기존에 작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리가 한 걸음 물러났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번은 아니지만, 다음에 태어날 기술을 위해 권리를 양보하는 것은 내가 될 수 있다.
막을 수 없는 변화라고 해서 우리는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가? 아니다. 저들만큼 훌륭한 기술자, 자본가가 될 수는 없어도 똑똑한 소비자는 될 수 있다. 주어진 범위 내에서만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도와준다는 명목하에 자신들의 특권을 이용해서 약자를 오히려 괴롭히는지 등을 살펴보는 감시의 눈이 되어야 한다. 감시의 눈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술의 탈선은 줄어들고 제재를 가할 법은 빠르게 정비된다. 미국의 작가들도 이번 패소에 완전히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작물의 올바른 사용 여부를 지켜보는 눈이 되길 바라는 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