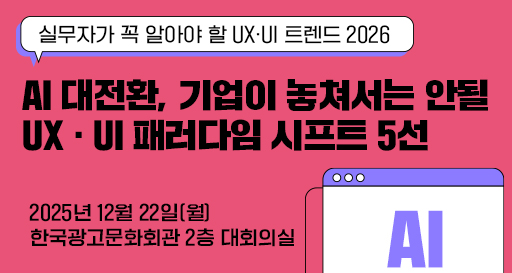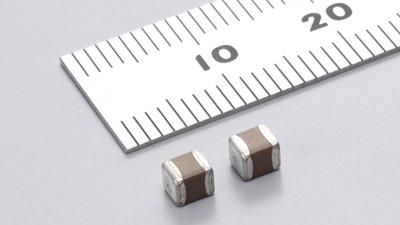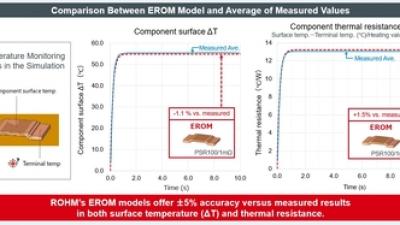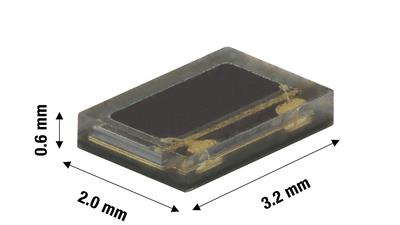신제용 LG전자 책임연구원은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세계 곳곳에서 열리는 메이커 페어를 찾아다닌다. 각 지역 메이커 페어에서 최신 제품과 기술을 접하고, 지역별 장단점을 비교한다. 다양한 경험은 자신의 메이커 활동에 큰 자산이 됐다.

신 연구원은 “서울을 포함해 중국, 일본, 미국, 이탈리아, 독일 등에서 열린 메이커 페어를 다녀왔다”며 “메이커 페어마다 행사가 열리는 국가나 도시의 모습이 반영돼 특색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역 축제 같은 느낌이라고 했다. 메이커들이 만든 제품을 관람객이 함께 보고 즐기고, 서커스와 볼거리, 먹거리 등 체험 행사와 함께 열린다. 일본은 특유의 오타쿠 문화 영향을 받아 개인이 만든 제품이 많고, 완성도도 높다. 반면 중국은 철저하게 판매를 위한 상업적 제품이 특징이다. 해외와 달리 한국은 아직 뚜렷한 특징이 없다.
신 연구원은 “우리나라 메이커 페어를 보면 아직 물음표”라며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는데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체성이 없는 것은 아직 한국의 메이커 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신 연구원은 “미국 등 해외에선 고등학생이 전기차를 만들어 관람객과 함께 즐긴다”며 “반면 한국은 입시와 취업 등의 문제 때문에 어려서부터 메이커 문화를 접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창조경제가 국정화두로 대두되고, 메이커 문화 역시 조명 받지만 여기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에선 제품을 만들면 고객 피드백을 받고, 이를 반영해 제품을 업데이트하고 개선한다”며 “우리나라도 정부가 메이커나 스타트업을 지원할 때 평가기준에 고객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의 지원기준이나 기술기준에 따른 평가가 시장에서 그대로 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신 연구원은 “정부가 지원사업을 운영할 때 사용자나 고객의 평가를 받도록 하거나, 기업과 연계해 제품 실용화까지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메이커 역시 외부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면에서 상업적인 메이커 문화가 발달한 중국을 좋은 모델로 꼽았다.
그는 “중국 메이커 페어에 가면 개발자가 관람객에게 ‘어떤 것을 원하느냐’고 묻는 등 적극적인 피드백을 구한다”며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 팔기 위해 오픈 마인드로 다가온다”고 설명했다.
또 한 가지 국내 메이커 문화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리서치’를 꼽았다. 대부분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시장 현황이나 트렌드, 가격정보 등을 조사하는 데는 소홀하다는 평가다. 정보 획득을 위해 해외 메이커 페어 방문도 추천했다.
신 연구원은 “국내에서 해외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에 제품을 올린 분들 중에 이미 수개월 전에 나왔던 외국 제품과 비슷한 경우도 봤다”며 “시장에 어떤 기술과 제품들이 있었고, 어디에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메이커 활동을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만드는 것도 열심이다. 전공인 소프트웨어 기술을 살려 현재 있는 제품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연계해 좀 더 나은 기능을 가진 제품으로 업그레이드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
신 연구원은 “헬스용 자전거나 스텝퍼에 IoT 장치를 부착해 운동량을 실시간으로 휴대폰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개발한다”며 “기존 물건의 가치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높일 수 있는 활동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메이커는) 궁극적으로 다양한 제품에 간단한 장치를 더해 더 스마트한 기기로 만드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