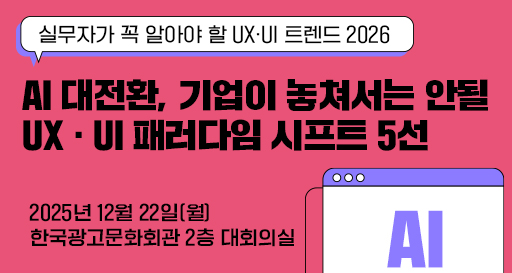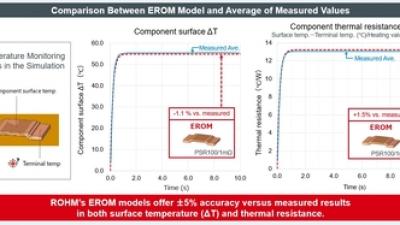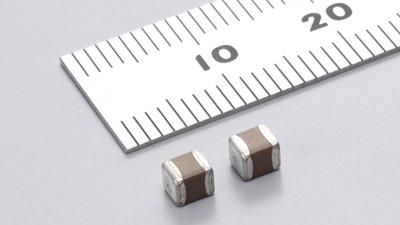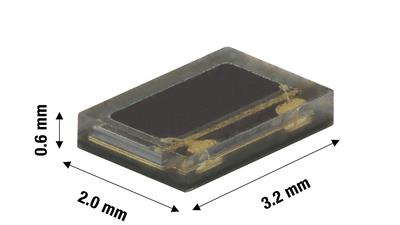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영국에서 흔히 농담처럼 한다는 말부터 꺼냈다. ‘세계 어딜 가도 영국보다 음식이 맛있고 기후가 좋다. 영국에는 자녀를 맡겨둘 수 있는 좋은 기숙학교가 있으니 해외로 나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해외로 나가는 데 거리낌 없는 영국인들이 세계 인구와 면적의 약 25%를 통치했던 시기가 있다.
권 원장이 소개한 ‘제국(닐 퍼거슨 지음)’은 비가 많이 내리는 섬나라 영국이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가진 큰 제국이 됐던 때를 다양한 관점에서 소개한 책이다. 원래 이 책은 ‘제국: 영국은 어떻게 근대세계를 만들었는가’라는 제목으로 영국에서 출간됐다. 미국에서는 ‘제국: 영국적 세계 질서의 흥망과 강대국을 위한 교훈’으로 나왔다.
권 원장은 “미국은 영제국의 흥망성쇠를 통해 세계 선도국가의 지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한 조언을 구하고 싶었겠지만, 내 경우에는 유럽 변방의 작은 섬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지배했는지 그 단초를 찾고 싶었다”고 책을 읽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제국’은 영제국 400여 년의 역사를 담고 있다. 설탕 무역으로 이윤을 남기기 위해 카리브 해로 진출한 해적들부터 아프리카를 탐험한 선교사, 인도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영국인들의 모습까지 그 시기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권 원장은 여타 제국들과 다르게 영국이 세계에 식민지를 늘려가면서도 막상 많은 비용을 치르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수억 명의 인구를 통치하는 인도의 행정 사무직 인원의 경우 가장 많을 때에도 1000명을 넘지 않았다. 국방예산은 1989년에 4000만파운드가 조금 넘는 정도로 국민 순생산의 2.5%에 불과했다. 이는 영국이 많은 자치를 식민지에 건네주는 ‘간접 통치’ 방식을 취했고 영국에 협조적인 엘리트를 양성했기 때문이다.
재산권과 정치 제도 덕분에 영국 지배가 사라진 뒤에도 영국 식민지로 있던 많은 국가가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등의 식민지보다 잘 살게 되기도 했다. 이처럼 강력한 영제국의 근원에는 무기와 해군뿐 아니라 발전된 형태의 토지보유권, 은행업, 보통법 등이 있었다.
이러한 영국 제국의 특성들을 들면서 권태신 원장은 “사회·경제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우리 사회의 현주소에 대한 고민도 이어졌다. 권 원장은 “우리나라는 성장잠재력 저하와 고령화 사회 진입, 청년실업 등 각종 사회문제를 고민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그는 “경제민주화 정책에 발목 잡힌 기업은 투자를 미루고, 이에 따라 일자리가 늘지 않고 있다”며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해외로 투자된 자본이 약 3000억달러인 데 반해, 국내로 들어온 해외 투자 자본이 약 1000억달러밖에 불과한 것은 한국이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권 원장은 “영제국의 확장에서 힌트를 얻어 보면, 이윤을 쫓는 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부는 법치를 실시하는 최소한의 역할만 해야 하며 노동과 자본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