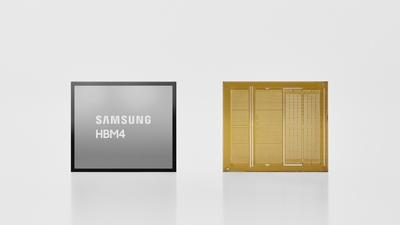1990년대 초반이다. 모토로라는 휴대폰 시장에서 승승장구했다. IBM은 3년간 누적적자 160억달러로 빈사 직전이었다. 레노버는 자국 점유율도 보잘 것 없는 중국 PC 제조업체였다. 이 레노버가 2014년 1월 말 일주일 간격으로 IBM x86 서버 사업과 모토로라 인수를 선언했다. 20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
모토로라는 휴대폰 원조답게 시장과 기술 혁신을 이끌었다. `스타텍`과 `레이저`가 그 상징이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 삼성, LG와 같은 신흥 주자에도 밀렸다. 애플 스마트폰 혁신과 동시에 아예 무대 밖으로 쫓겨났다.
IBM은 CEO를 맡겠다는 이가 없을 정도로 회생 불능 판정을 받았다. 결국 카드, 식품·담배 회사 CEO 출신 루 거스너 회장이 왔다. 그는 이 공룡 기업을 여러 작은 회사들로 쪼갤 줄 알았는데 그냥 놔뒀다. 고객 중심으로 조직과 인적 혁신에 몰두했다. 곧 극적인 흑자 반전과 함께 IBM이 부활했다.
거스너 회장도 살리지 못한 게 PC사업이다. 오래 전 경쟁력을 잃었지만 원조 사업 미련이 컸다. 눈덩이 적자를 견디다 못해 샘 팔사미노 회장이 2005년에 매각했다. 최근 IBM이 위기다. 매출과 이익이 준다. 남은 하드웨어 사업도 PC사업처럼 경쟁력을 잃은 탓이다. 결국 저가 서버사업을 팔았다. 다음 차례는 반도체다.
그런데 IBM은 사업을 팔아도 핵심 역량 개발까지 버리지 않는다. 고가 서버 사업과 반도체 R&D를 계속한다. 모토로라는 달랐다. 모바일 사업에 집중한다고 장비, 반도체 사업을 죄다 정리했다. 갑자기 모바일 패러다임이 스마트폰으로 바뀌었다. 비빌 언덕은 이미 사라졌다. 최근 1년 새 주인만 두 번 바꾸는 신세가 된 이유다.
양위안칭 레노버 CEO는 2001년 이 회사를 인수할 때부터 글로벌 하드웨어 최고 기업이란 꿈을 꿨다. 중국 기업이 사양길 PC 사업으로 불가능한 꿈이다. 빠른 길을 인수합병(M&A)에서 찾았다. 선진 기업도 접은 사업을 끌어 모아 몸집을 키운 다음 질적 성장을 한다는 전략이다. IBM PC 사업 인수로 이 전략의 유효성을 확인했다. 이제 서버, 스마트폰 사업에 재연하려 한다. 상당수 특허를 포기한 채 모토로라를 인수한 것도, 지난해 미국 클라우드 기술 업체를 인수한 것도 다 같은 맥락이다. M&A 덕분에 레노버는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TV까지 하드웨어 전문 기업 면모를 갖췄다. 그것도 상위권에 곧바로 진입했다. 영역이 겹친 삼성·LG에는 아주 껄끄러운 상대다.
미국과 중국 간 기술 분업화도 주목할 현상이다. 미국 기술 기업은 하드웨어 부가가치가 떨어지면 해외에 넘기고 핵심 솔루션과 서비스에 집중한다. 그간 일본, 그리고 한국, 대만 기업이 그 혜택을 봤다. 이제 중국 기업 차례다. 더욱이 미국과 직거래한다. 특히 일본 기업이 낭패다. 새 활로를 찾지 못한 채 중간에 붕 뜰 가능성이 높아졌다. 소니가 PC 사업을 접고, TV사업을 떼어내는 것은 그 위험 신호다.
삼성·LG는 핵심 부품소재까지 하드웨어 사업을 수직 계열화했다. 장기적 안목의 의사결정도 가능하다. 적어도 일본 기업 꼴은 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미국·중국 기술 분업화가 더 활발해지면 상황이 달라진다. 여기에 일본 기업이 매각할 사업이 중국 기업에 가면 매우 위협적이다.
중국 기업은 글로벌 마인드 측면에서 우리보다 앞선다. 레노버만 해도 본사를 중국과 미국에 동시에 뒀다. 화웨이는 우리도 못한 통신 시장 개척에 성공했다. 레노버의 최근 행보는 한·중 하드웨어 경쟁이 본격화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정작 이 중국 기업들을 우리만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이것이 정말 걱정이다.
신화수 논설실장 hs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