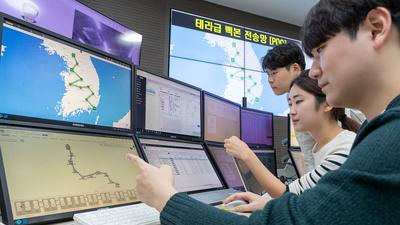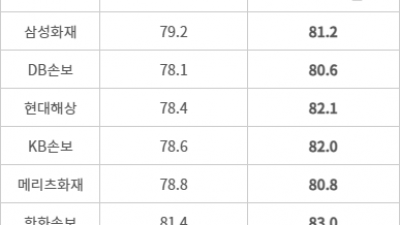연초 정부 조직 개편 당시 이미 예고된 일이다.
부처가 재편되면 산하기관도 소속이 바뀌는 것은 당연지사다. 부처 아래 한 줄로 나란히 서 있는 산하기관이야 줄 바꿔 세우면 그만이지만 그 안의 기능을 들여다보면 얘기가 복잡해진다. 왼손을 앞 사람 어깨에 얹고 줄을 맞췄는데, 오른손은 옆줄 쪽으로 올려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 평가 관리 기능도 그 중 하나다. MB 정부 때 한차례 뒤섞인 것을 현 정부 들어 되돌리려하니 `공사`가 커질 판이다. 연초엔 급한 대로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에 얼기설기 엮어놓긴 했는데 깔끔하게 매듭을 풀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그냥 놔두기도 애매하다.
모름지기 조직과 기능은 더하는 것이 환영이지만, 빼는 것은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게 인지상정이다. 명확한 정답이 없고 이해타산이 작용할 때는 더욱 그렇다.
이럴 때 수 싸움이 시작된다. 더하기 위한 논리, 빼기 위한 논리가 각자의 진영에서 방어벽을 한층 높여간다. 섣불리 결정적인 카드를 꺼내는 것은 초보자들이나 하는 실수다. 어설프게 카드를 일찍 내보이면 내 방어벽 한층만 갉아먹는 꼴이 된다.
전후좌우를 살피되 결정적인 순간에 핵심 카드를 꺼내야 한다. 반전을 위한 여유분의 카드 한 장쯤은 남겨놓아야 한다. 연초 부처 조직 개편을 놓고 일어났던 일의 축소판과 다름없다.
부처가 각자의 시각에 따라 국가 발전에 적합한 주장을 하는 것을 탓할 생각은 없다. 정말 어떤 게 국가를 위한 길일까. 걱정스러운 점은 부처 간 이해를 맞추기 위해 협상의 부산물을 만드는 것이다.
이미 R&D 평가관리 종사자들 사이엔 “A와 B를 주고받는 `딜`이 이뤄질 것”이라는 식의 루머가 우스갯소리처럼 돌아다닌다.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을 지켜보는 시각이 그다지 호의적이진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가를 위한 공정한 수싸움은 환영하지만 짜맞추기식 딜은 사절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