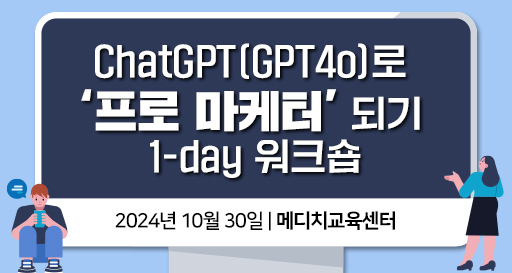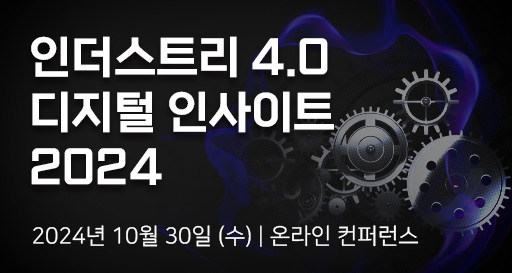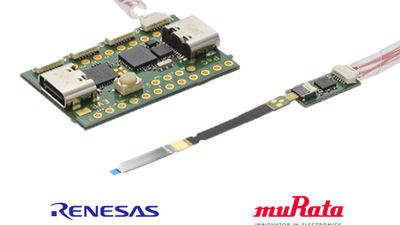세금 전쟁이다. 세수 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 경기 회복이 더딘데다 세수가 목표치에 크게 미달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걷힌 세수는 73조6000억원. 지난해에 비해 9조4000억원이나 줄었다. 징수율도 35.4%에 그쳐 5년간 평균 41.1% 보다 5.7% 포인트나 떨어졌다.

정부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정권 초기는 의례 의욕이 앞선다. 창조경제를 위해, 복지와 민생 혹은 안보를 위해 거의 일주일이 멀게 정책을 쏟아냈다. 정책 실행은 결국 돈인데 재원인 세금이 안 걷힌다니 속이 타들어 간다. 목표는 창대한데 자칫 부족한 세수에 발목이 잡힐 수 있는 상황이다.
호흡이 가빠질 수밖에 없다. 당장 국세청이 분주해졌다. 이전보다 까다로운 세수 관리에 산업계에서는 입이 쑥 나왔다. 경기 불황으로 곳간은 갈수록 비어 가는데 이중, 삼중으로 세금 압박을 받으니 당연한 반응이다. 기재부는 아예 세금 체계 전반을 손보겠다고 칼을 빼들었다. 조세연구원에 의뢰해 보고서를 내놓고 공청회를 시작했다. 골자는 2017년 세수 18조원을 목표로 비과세·감면 혜택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십분 공감한다. 국세 수입액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과세와 감면을 손질하겠다는 기본 방향도 수긍이 간다.
그러나 개편안 중 연구개발(R&D)부분은 숨이 턱 막힌다. 개편안에서는 시설투자와 R&D 관련해 인력 개발비 등 비용 범위를 조정하고 R&D설비 투자분의 세액 공제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규모 차이는 있겠지만 한 마디로 R&D와 설비투자에 주던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위험한 발상이다. R&D는 새 정부 최대 국정 과제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인프라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는 접어 두자. R&D에 공제 혜택을 준 이유는 민간 R&D를 활성화하고 생산적인 기업 활동에 확실한 동기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R&D분야가 활성화되면 시장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자극제로 작용해 경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배경이다. 결국 활기찬 선순환 경제의 출발점이 R&D다.
때문에 4대강 사업에 예산을 무차별적으로 쏟아 부었던 지난 정부에서도 R&D만은 `금기 영역`이었다. 2009년 세계 경기가 꺾이면서 미국(-2.9%), 일본(-10.8%) 등은 R&D 투자를 축소했지만 우리는 적극적인 R&D정책에 힘입어 오히려 8.3% 가량 늘었다. R&D 설비투자 세액 공제율도 2008년 7%에서 10%로, 중소기업 R&D 세액 공제율도 2009년 15%에서 25%로 확대했다. 덕분에 우리 경제가 그나마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도 연착륙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
수많은 정책 실현을 위해 세수,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당장 급하다고 R&D공제율까지 건드는 건 앞뒤가 바뀌었다. 새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국가R&D에 92조4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정부 68조원에 비해 24조4000억원이나 늘었다고 은근히 자랑했다. 국가 R&D규모를 늘린 건 칭찬받을 일이다.
하지만 선진국일수록 정부 주도 R&D 보다는 민간이 훨씬 중요하다는 게 정설이다. 기업을 자극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방법을 틀어막고 무차별적으로 세수를 확보해 국가 R&D에 투자하겠다는 발상은 상식 밖이다. 세수를 제대로 걷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과연 누구를, 무엇을 위한 세수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