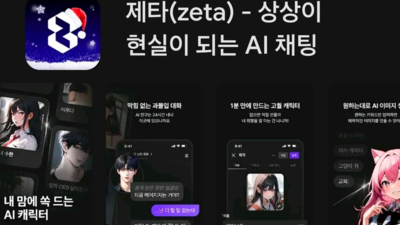“네오위즈게임즈가 기존 사업 방식을 끝까지 고집했다면 지금보다 더 큰 위기를 맞았을 겁니다. `다시 해보자`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고 조직과 사업도 최적화했으니 하반기부터는 성장을 자신합니다.”

뒤쳐진 모바일게임 사업, 히트작 없는 온라인게임, 줄줄이 빠져나간 핵심 인력, 7월 `크로스파이어` 계약 만료…. 탈출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네오위즈게임즈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28일 분당 구미동 사옥에서 만난 이기원 네오위즈게임즈 대표 얼굴에서 이런 어려움은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며 빙그레 웃었다. 이 대표는 “숫자만 보면 네오위즈는 이미 고꾸라졌다”며 “당장 겉으로 보이는 숫자보다는 업계에서 인정받는 회사로 빨리 발돋움하고 싶은 욕심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모든 힘의 원천인 직원들이 침체한 분위기를 딛고 일어서 다시 도전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도 희망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 가장 듣고 싶은 평가는 `네오위즈, 살아있네~`라는 말”이라며 웃었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고 했던가. 네오위즈게임즈가 믿고 있는 양 날개는 2011년부터 다져온 모바일 게임 사업 경험과 대기 중인 온라인 게임 신작들이다. 최근 퍼블리싱한 모바일 게임 `가속스캔들`을 시작으로 매달 2~3종의 자체 개발 및 퍼블리싱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블레스` `프로젝트 블랙십` `바이퍼서클` 등 지난 2~3년간 야심차게 개발해온 온라인 게임들도 하반기와 내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국내외 시장 공략에 나선다.
이 대표는 “네오위즈게임즈는 과거 매년 10~20개의 온라인 게임을 퍼블리싱했는데 현재 시장은 기존 방식을 고수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됐다”며 “네오위즈의 강점인 퍼블리싱 역량을 활용하되 자체 개발작으로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경쟁력 있는 게임 지식재산(IP)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네오위즈의 고유 게임 IP 생산은 엔에스스튜디오와 스튜디오 디젤을 책임지는 윤상규 대표가 맡았다. 네오위즈의 핵심 온라인 게임을 개발하고 해외 서비스하는 중추 역할을 한다. 이 외에 내부적으로 5개 모바일 게임 스튜디오에서 약 10개 프로젝트를 가동 중이다.
이 대표는 모바일 게임 사업에도 자신감을 보였다. 이미 2011년부터 시작한 모바일 게임 사업 경험이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예전에는 테스트 형태로 게임을 출시했는데 전략을 바꿔 작품 하나하나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며 “올해 내부 개발작과 퍼블리싱 작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며 모두 기대가 큰 작품들”이라고 설명했다.
모바일 게임 사업이 뒤처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모바일 게임 시장에 영원한 승자는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꾸준히 성공 경험을 쌓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노하우를 아는 것이 중요한 데 네오위즈는 일찌감치 이 경험을 축적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자평했다.
또 “현재의 위기가 장기적으로 더 큰 성장을 위한 자양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최근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우뚝 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