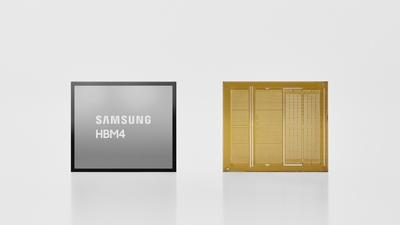50대 중반의 남자다. 잘나가는 대기업 임원이었다. 실적도 매우 좋아 승진을 요청했다. 임원 연한이 차지 않아 안 된다는 답이 돌아왔다. 작년 말에 미련 없이 사직서를 냈다. 그는 사실 몇 년 전부터 은퇴자 대상 창업을 구상했다. 월급쟁이를 할만큼 했으니 `코딱지`만한 회사라도 오너가 되고 싶었다. 더 늦어지면 힘들겠다고 봤다. “사실 제 또래가 창업하기 딱 좋아요. 경험과 지혜도 있고, 인맥도 좋죠. 그런데 대부분 직장생활 연장만 생각하죠. 길어봤자 2~3년 더 할 뿐인데….”
창조경제 열풍 속에 벤처 창업 붐이 인다.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은 그 기폭제로 손색이 없다. 3조3000원을 쏟아 붓고 투자금 소득공제 확대, 인수합병(M&A) 규제 완화 등 벤처 창업 활성화를 꾀한다. 그런데 의문이 생긴다. 누가 창업을 하지.
정부는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패기를 기대하나 정작 이들은 창업을 준비할 겨를도, 실력도 부족하다. 20대엔 취업전선에 내몰렸다. 취직을 해도 적응하느라 바쁘다. 일부가 창업에 도전하지만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 허점투성이라 초기 투자 유치도 힘들다. 이렇다 할 인맥도 없어 도움받을 길도 없다. 눈길도 끌지 못하고 사라지는 수많은 스마트폰 앱. 성공 가능성이 너무 낮은 청년 창업의 상징이다.
40~50대는 젊은이에게 부족한 것을 모두 갖췄다. 경험과 인맥이 풍부하다. 곁눈질로 배웠다고 하나 사업성 판단도 잘 한다. 이들의 약점은 몸담은 조직에서 밴 고정관념, 가족 생계를 짊어지면서 잃은 도전정신 정도다. 이것만 뛰어넘으면 청년 창업보다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우리는 `창업=젊음`이란 공식에 얽매였다. 혹시 성공 벤처기업 CEO의 이른 창업 연령에서 비롯한 착시는 아닐까. 스무 살 안팎에 창업한 페이스북 공동 창업주를 비롯해 20대가 많다.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구글을 창업한 나이는 스물다섯이다. 서른 살에 아마존을 세운 제프 베조스는 늦은 편에 속한다. 이것만 보면 벤처 창업이 20~30대 전유물로 여겨진다.
지난해 나온 미국 카우프만재단 보고서가 이런 인식을 확 깬다. 2011년 20~34세에 창업한 비율이 29.4%, 35~44세는 22%였다. 45~54세는 27.7%, 55~65세는 20.9%다. 미국에서도 창업을 40대 이상이 주도한다. 그 비율은 1996년 조사 때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우리나라도 중장년 창업이 많아졌다. 그런데 직장에서 밀려나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생계형 창업이 대부분이다. 준비가 없다보니 그동안 쌓은 경험과 지혜, 인맥과 무관한 사업이 많다. 성공 가능성도 낮다. 당사자에게도, 사회적으로도 너무 큰 손실이다.
사회경제적 효과로 보면 중장년 창업이 청년 창업보다 더 중요하다. 고령화시대다. 자녀 양육으로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이들은 앞으로 10~20년을 더 일해야 한다. 창업 밖에 답이 없다. 해온 일의 연장선이라면 해당 산업 경쟁력에도 일조한다. 무엇보다 청년 실업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
정부 정책, 기업 문화, 사회 인식은 중장년층을 도전이 아닌 생계형 창업에만 내몬다. 벤처 창업 정책은 온통 청년에 집중됐다. 사내 벤처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들도 젊은 사원만 겨낭하지 창업을 꿈꾸는 간부들이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한다. 무엇보다 중장년층 스스로 창업을 은퇴 이후의 일로 여겨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에 벤처 성공 스토리가 없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거의 유일하다. 서른세 살에 한게임을 창업한 그는 2010년 마흔네 살에 카카오를 세워 더 큰 성공을 거뒀다. 그 사이 더 풍부해진 경험과 인맥, 지혜 덕분이다. 지금 우리 벤처산업에 필요한 창업가는 서른세 살 김범수가 아니라 마흔네 살 김범수다.
신화수 논설실장 hs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