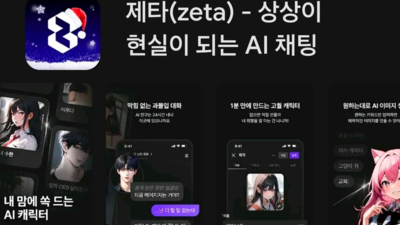밤낮으로 하늘에 둥실 떠있는 달. 풍요의 상징이며 수많은 전설과 시에 단골로 등장하는 달은 인간과 가장 밀접한 천체다.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있지만 사실 인류는 달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다. 지구에서 약 38만 4400km 떨어졌고, 화학로켓으로 가는데 나흘 가량 걸린다는 사실 정도다. 질량은 지구의 81.3분의 1이며, 반지름은 지구의 4분의 1이다.
자전과 공전주기가 같아 우리에겐 언제나 한쪽 면만 보여주고, 주기가 29.53일로 달력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여성의 생리주기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미국과 소련이 자존심 싸움을 벌인 1967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가 달의 `고요의 바다`에 착륙했다. 인간이 외계에 첫발을 디딘 역사적인 순간으로 인류는 기억한다. 5년 뒤 작가 빌 케이싱이 `We Never Went to the Moon`이라는 책을 발표했다. 그 다음부터 달 착륙 조작설과 은폐설이 번지기 시작했다. 지금도 미국인의 6%는 달 착륙이 조작됐다고 믿는다.
달 착륙 조작설과 함께 달에 대한 미스터리도 흥미거리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달의 반대편에는 고도의 문명이 존재한다거나 달 자체가 인공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천체라는 설도 있다.
최근 세계 각국이 다시 달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달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다. 미국항공우주국(NASA)과 유럽우주국(ESA)이 `오리온`이라고 이름 붙인 우주캡슐 개발에 나섰다. 오리온이 향할 천체는 달이다. 지난달 러시아 연방우주국은 2015년 달 궤도를 탐사할 무인 우주선을 달에 보낸다고 발표했다.
중국과 일본도 달 탐사 경쟁에 참여했다. 중국은 올해 안에 달 탐사를 위한 위성 `창어 3호`를 발사하기로 했다. 일본은 오는 2020년까지 유인 우주선을 달에 보낼 계획이다.
달 탐사 경쟁은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간 자존심 대결이었다. 지금은 인공위성 시장 선점과 자원 확보가 목적이다. 자존심 이외엔 실익이 없어 중단됐던 달 탐사가 천문학적 비용을 투자할만한 가치 있는 사업이 된 것이다. 물론 우주기술 강국이라는 명분도 덤으로 따라온다.
우리나라도 우주강국 대열에 발을 걸쳤다. 우여곡절 끝에 나로호 발사를 성공했다. 당초 2025년으로 계획된 무인 달 탐사선 발사시기를 2020년으로 앞당기는 모멘텀이 될 만하다.
하지만 달 탐사 계획은 시간에 쫓기는 느낌이 여전하다. 핵심인 한국형 발사체 개발은 정부의 의지는 물론, 시간, 인력, 돈과의 싸움이다. 무리한 달 탐사 일정은 나로호보다 더 큰 시련을 안겨줄지 모른다. 달 탐사와 같은 우주개발은 국가 실익이 우선돼야 한다. 달에 태극기를 꽂겠다는 감성적 생각보단 달 탐사를 통해 무엇을 얻을 것인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정재훈 전국취재 부장 jh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