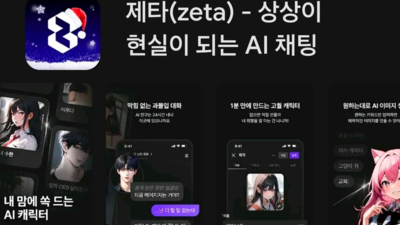삼성전자가 작년 실적을 공개했다. 매출 201조원, 영업이익 29조원 사상 최대 실적이다. 유수의 글로벌 기업도 쉬 달성하지 못하는 대기록이다. 콧노래가 절로 나올 법 하다. 그런데 실적발표 현장을 다녀온 기자가 전하는 그곳의 분위기는 `어둡다`였다.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최근 본격화된 원화강세다. 삼성전자는 최근 6개월간 원화강세로 9300억원 손해를 봤고, 이런 추세라면 올해 3조원의 이익감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현대자동차도 사상 최대 매출 달성 소식을 전해왔다. 매출 84조4700억원, 영업이익 8조4370억원, 영업이익 성장률은 2011년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인 10%다. 세계 최고 수준이다. 세계 자동차 기업 중 두 자릿수 영업이익을 낸 곳은 현대차와 BMW뿐이다. 폭스바겐·닛산·혼다의 6%대 영업이익, 도요타 5%대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런 현대차도 표정이 밝지 않다. 역시 환율 때문이다. 원화가치가 급등한 지난 4분기 현대차의 영업이익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1.7%가 하락했다. 올해 원화가치가 10% 오르면 영업이익이 2조2000억원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악의 환율변수를 대입하면 이 두 기업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적게는 10분의 1, 많게는 4분의 1가량 줄어든다. 매출의 70~80%가 해외에서 나오는 이들 기업의 표정이 어두운 이유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 기업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것은 실력 덕이 아닌 대외변수 즉, 환율 덕이었을까. 기술경쟁력이 아닌 단순히 가격경쟁력 때문이었다는 말일까. 그게 사실이라면 불안하다.
지난 4분기 이후 가장 큰 원화가치 변동폭을 보인 것은 일본 엔화다. 지난해 10월초부터 지금까지 달러당 원화가치는 1113원에서 1074원으로 3.5% 상승한 데 비해 100엔당 원화가치는 1426원에서 1185원으로 16.9%나 올랐다. 지난해 12월 집권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 경제를 살리겠다며 엔저카드를 꺼내든 탓이다. “어려운 시기에 이웃나라를 거지로 만들 작정이냐”며 주위에서 일본을 성토한다. 여기저기서 일본 때문에 죽겠다며 아우성이다. 주인공은 `아베 신조`, 제목은 `엔저 대공습`. 이 영화 왠지 낯설지 않다. 어디서 본 듯한, 과거 경험해 본 듯한 일종의 데자뷰다.
6년 4개월전인 2006년 9월, 제90대 일본 총리 자리에 아베 신조가 올랐다. 당시도 아베는 `강한 일본`을 부르짖으며 엔저시대를 예고했다. `성장 없이 미래 없다`며 집권 초기부터 강력한 엔저 분위기를 연출했다. 820원대 중반이던 100엔당 원화가치는 이듬해 6월말 740원대 후반까지 급등했다. 그때도 우리 재계는 지금처럼 아우성을 쳤다.
집권 후기 정국불안에 따른 지지율 급락으로 아베 정권은 1년만에 막을 내렸다. 엔화가치는 급락했다. 2008년 1월 870원대이던 엔화는 일년 후 1600원대로 대폭락했다. 이후 1300~1400원대를 오르내리다 아베 재집권 후 1070원대 시대가 다시 왔다.
최근 4년간 이어진 초(超)엔고현상 탓에 일본 전자업계는 지옥을 다녀왔다. 지금까지 살아남은 게 용할 정도다. 일본이 주춤하는 사이 우리 수출기업은 세계 시장에서 적지 않은 반사이익을 챙겼다. 엔고현상은 영원할 수 없다. 우리 기업도 잘 안다. 그런데도 호시절에 열매만 챙기고 씨 뿌리는 일에 게을렀던 건 아닌지 반추해볼 일이다. 아베 선생의 반복학습에서 우리가 익혀 쌓은 실력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언젠가 다시 올 엔저상황에 대비하지 않았다면, 비축해 놓은 카드가 없다면 그간의 학습효과는 낙제점이다. 지금 우리 기업의 호들갑이 부디 엄살이길 바랄 뿐이다.
최정훈 성장산업총괄 부국장 jh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