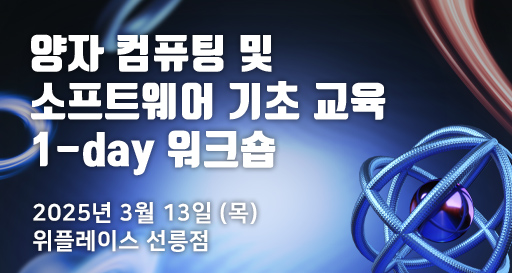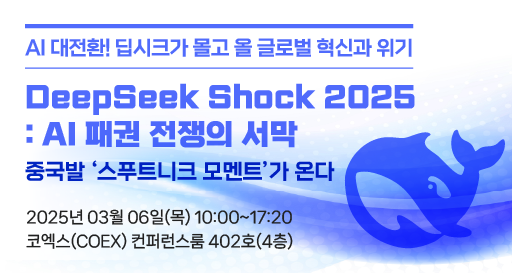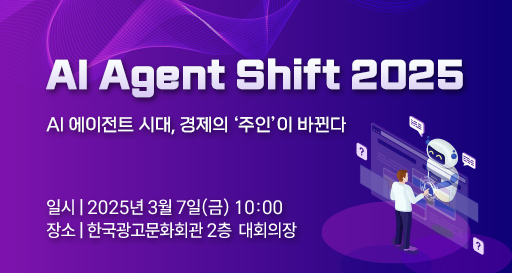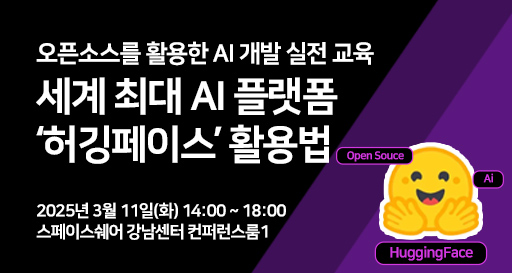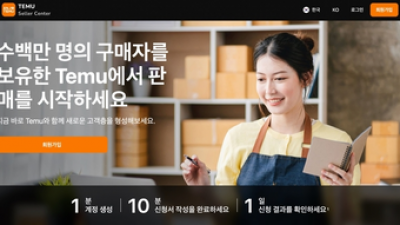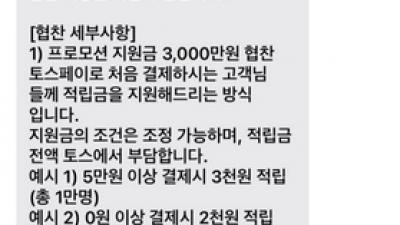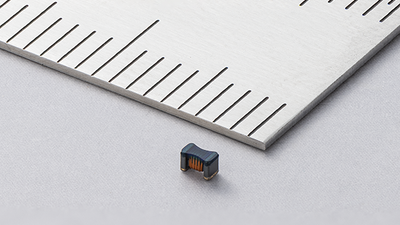“서비스나 마케팅 역량을 갖춘 모바일 게임사만이 성공할 수 있다.”
국내 소셜게임 시장에서도 소기의 성공사례가 등장했지만, 치열한 경쟁으로 중소 개발사 생존은 쉽지 않다는 예측이 나왔다. 일찍 투자를 유치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내거나 대기업의 도움을 받는 합종연횡 현상도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10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2 스마트&소셜게임 콘퍼런스` 현장에서는 모바일 게임 업계의 다양한 생존 전략이 제시됐다. 글로벌 경쟁 때문에 개발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지속적 서비스나 마케팅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대세를 이뤘다.
이영일 컴투스 부사장은 자사 스마트폰 게임 `타이니팜`의 사례를 들면서 지속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했기 때문에 성공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 부사장은 “게임이 나오자마자 좋은 반응을 얻지는 못했다”며 “컴투스 다른 게임과 연결해 다양한 마케팅과 프로모션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이용자가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시장이 미국보다 인수합병 규모가 작고, 온라인이나 콘솔 게임에 비해 모바일 게임의 수명이 짧다고 평가했다. 국내에만 100개 이상의 소셜 게임사가 있지만 성공사례는 서비스와 마케팅 역량을 갖춘 기존 게임 업체에서만 나왔다는 분석이다.
투자자가 바라보는 모바일 게임 시장의 미래는 더 냉정했다. 온라인 게임과 마찬가지로 모바일 게임도 독보적 기술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웅 스톤브릿지캐피탈 팀장은 모바일 기반 소셜게임은 해외에 내로라하는 업체가 이미 자리를 잡은 반면에 국내에는 투자 가치가 높은 게임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소셜 게임의 미래는 무작정 장밋빛이 아니고, 온라인 게임보다 수익이 낮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 팀장은 “스타트업은 개발만 하고 서비스는 큰 회사가 해주리라는 발상은 위험하다”며 “개발사와 서비스 업체가 수익은 나누던 온라인 게임과 달리 스마트폰 시장은 페이스북이나 구글처럼 플랫폼을 장악한 기업이 수익을 가져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