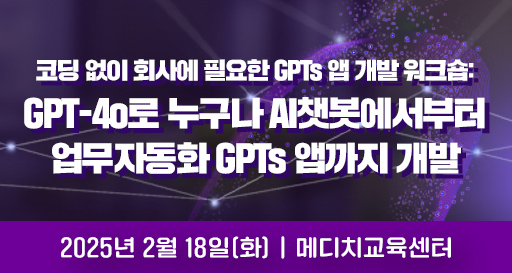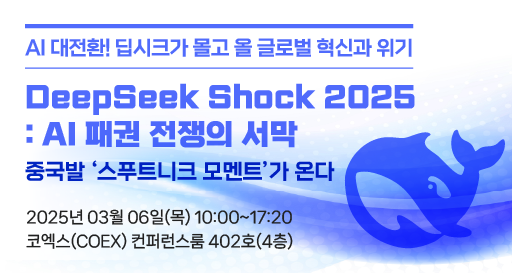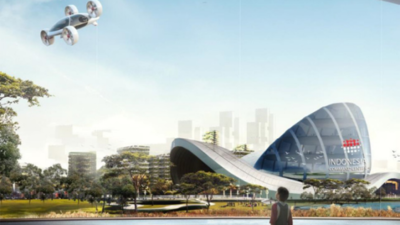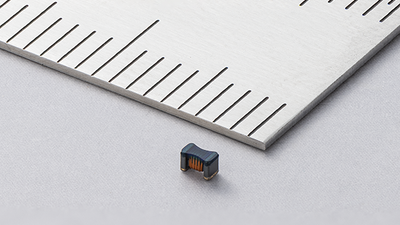정부는 올해 초등학생 이하 과학신동프로그램을 시작함으로써 초·중등(과학영재교육원), 고등(과학영재학교·과학고·국제과학올림피아드), 대학(대통령 과학장학생·이공계 국가장학생), 대학원(석박사 과정 연구장학생)으로 이어지는 ‘전주기적 과학영재 특별 관리·육성체계 구축’을 완료했다. 물리천재로 유명해져 올해 인하대에 진학한 송유근 군(9세)이 미흡한 정부 교육제도 때문에 힘겨웠다는 지적에 적극 대응한 것. 그런데 정부가 확신하는 ‘전주기적 관리 체계’ 여기저기에 구멍이 숭숭 뚫렸다. 과학영재가 자유롭게 잠재력을 펼치는 환경이 조성되기보다는 좋은 대학을 향한 과학 사교육 열풍이 더 빨리 세력을 넓히는 추세다. 우리나라 과학영재교육의 현실을 3회에 걸쳐 들여다 본다.<편집자>
과학고등학교에 다닐 때 국제과학(수학·물리·화학·정보·생물·천문) 올림피아드에 나가 동상을 수상한 뒤 국내 유명대학 공대에 진학했던 A씨. 그는 지금 법관이 되려는 꿈을 꾼다. 역시 과학영재 엘리트 코스를 밟아 국제○○올림피아드에서 금상을 탔던 B씨는 의사가 될 작정이다.
과학영재교육의 꽃인 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 나가 동상 이상을 수상했던 옛 과학영재 가운데 35명이 서울대 의과대학에 갔다. 성균관대(13명), 연세대, 프린스턴대 등에도 과학기술자가 되려는 꿈을 접고 의사의 길로 들어선 과학영재들이 있다. 의사가 되려는 과학올림피아드 수상 경력자들은 작년 말 기준으로 모두 50명이고, 올해 대학입시에 나선 이들 중 5명이 의대진학을 확정했다.
우리나라 과학영재들이 1988년 수학올림피아드, 1992년 물리·화학·정보올림피아드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이래로 253명이 수상했고, 그 중 50명이 의대에 가려하니 비율은 19.7%다. 그리 염려할 수치가 아닌 듯하지만 1998년 생물올림피아드에 나가기 시작한 이후로는 27.4%(171명 중 47명)로 높아졌다. 과학영재 관리 기관인 한국과학재단이 집계하지 못했지만 ‘먼저 의대에 지원해 떨어진 뒤 이공계를 선택하는 이’가 상당수다. <본지 2006년 11월 2일자 15면>
어느 과학영재의 말처럼 “의학도 과학”이다. 또 갓을 쓰기 시작할 무렵(약관)에는 꿈이 쉽게 바뀔 수 있다. 한 과학영재가 과학기술자(공과대)의 꿈을 떨어내고 음악(작곡가)수업을 준비하는 것도 지극히 자연스럽다.
하지만 과학기술계 한 인사는 “기초과학 진흥을 위한 과학영재교육 정책 입안자들이 더욱 긴장할 때”라고 말한다. 자연·이공계열로 입학해 1년 이상 공부하다가 다시 대학입학시험을 치러 의대에 가는 제2, 제3의 과학영재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미더운 정책으로 튼튼하게 버텨줘야 한다는 것.
한 과학영재교육원 관계자는 “정부가 마련한 혜택들보다 의대로 가는 게 낫다는 인식을 바꿀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되묻는 정책 입안자 마인드부터 바꿔야 한다”며 “혜택을 늘려 쉽게 대응하기에 앞서 ‘즐겁고 신나는 과학 공부환경’을 만들 때”라고 말했다.
이은용·이호준기자@전자신문, eylee·new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