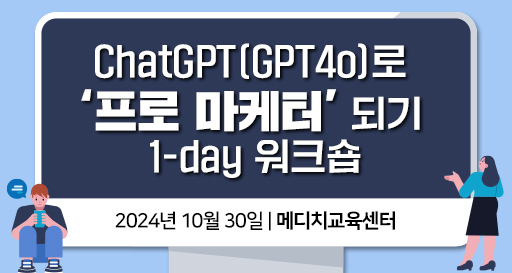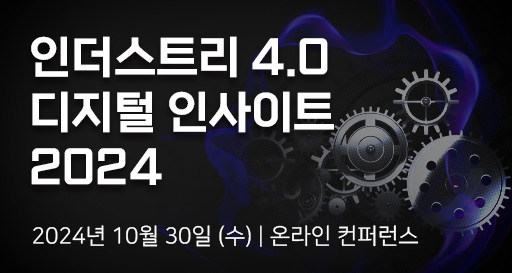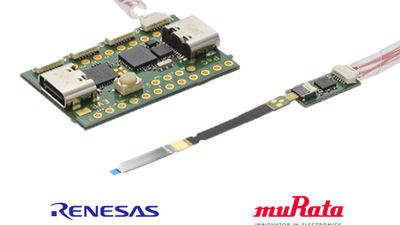#1.드디어 D-1. 오랜 숙원이 마침내 결실을 보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준비작업은 순조로웠다. 모든 준비는 사실상 끝났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출범을 선포하는 일만 남았다. 또 하나, 누가 초대 협회장을 맡느냐였다. 협회장이야 출범 선포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았다. 출범 선포를 위해 마지막 결제가 올라갔다.
윤종용 부회장은 지그시 눈을 감았다. 전자산업진흥회가 영 마음에 걸렸다. “구자홍 부회장의 생각부터 먼저 알아봐.”
구 부회장도 난감했다. 전자산업진흥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그였다. “디스플레이마저 떨어져 나가면 진흥회는 붕괴됩니다.” 진흥회 쪽 반대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는 고심 끝에 결론을 내렸다. “매우 죄송하다고 윤 부회장님께 전해.”
D데이를 눈앞에 두고 디스플레이산업협회의 출범은 그렇게 좌초됐다.
#2. 시간이 갈수록 분위기는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험악해져 갔다. “반도체도, 정보통신도, PCB도 협회가 있는데 디스플레이는 도대체 뭐야?” “세계 1위의 국가에서 협회 하나 없다는 게 말이나 돼?” “반도체 장비 부품은 무관세인데 왜 디스플레이 장비부품은 관세를 물어야 해? ” “우리끼리만이라도 협회를 만들자고. 힘을 합쳐야 돼.”
이번엔 장비재료 업체들이 전면에 나섰다. 이번에도 작업은 순조로워 보였다. 그들끼리 똘똘 뭉쳤다. 걸림돌은 더 없는 듯했다. 하지만 또 마지막에 변수가 나타났다. 갑자기 삼성전자와 협력사들이 불참을 선언해 버렸다. 삼성의 신경을 자극하는 LG 측의 발언이 보도된 것이 원인이었다. 사사건건 자존심 경쟁을 벌여 온 두 회사였다.
“일단 띄우고 보자고. 언제까지 눈치만 볼 거야?” 이렇게 해서 반쪽짜리 디스플레이장비재료협회(KODEMIA)가 탄생했다.
#3.“LG 위주의 반쪽짜리 협회로는 한계가 있어. 삼성 쪽의 참여가 있어야 해.” “리더 격인 패널업체들 없는 협회는 대표성이 없어. 장비재료협회를 패널업체들이 참여하는 디스플레이산업협회로 확대발전시켜야 해.”
온전한 협회를 원하는 회원사들의 성화가 이만저만 아니었다. 지난달 30일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 KODEMIA 주최로 CEO 조찬간담회가 열렸다. 다시 디스플레이산업협회의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이 자리엔 비회원인 삼성과 협력사 고위 관계자도 대거 참석했다. 분위기는 또 다시 무르익고 있다며 다들 들떠 있었다.
그러나 걸림돌은 여전하다. 삼성과 LG는 아직도 서먹서먹하다. 다른 점이라면 윤종용 부회장이 전자산업진흥회장직을 맡고 있다는 것이다.
이 세 장면은 우리나라 디스플레이산업계의 현실을 극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삼성과 LG는 위험을 무릅쓴 무모한 투자(?)를 감행하면서 디스플레이 왕좌에 올랐다. 그래서 지금은 거대한 협력사 군단을 거느린 양대 ‘지존’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아직도 물과 기름이다. 우리 지존 간의 갈등은 다른 결과를 낳고 있다.
대만이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벌써 두달째 대형 LCD패널 출하량에서 한국을 앞섰다. 중국도 비오이하이디스의 기술과 인력을 바탕으로 추격을 시작했다. 일본은 아예 LCD도 PDP도 아닌 차세대를 노리고 있다.
대만의 부상은 한국을 견제하려는 일본의 배려로 시작됐다. 하지만 급성장은 양 지존 간 갈등이 일조했다. 중국의 진입로는 우리나라가 스스로 만들어 주었다. 비오이하이디스를 손쉽게 손에 넣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비오이하이디스는 반도체 빅딜의 부산물이었다. 삼성과 LG 간 반목의 골은 반도체 빅딜로 깊어졌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부작용은 한국의 자존심인 디스플레이에서 고스란히 표출되고 있다.
돌아가는 형국은 두 회사가 힘을 합쳐도 벅찬 실정이다. 과거에 연연해 더 지체하면 늦다. 하루빨리 손을 맞잡아야 한다. 그 실마리를 협회 설립에서부터 찾아 보면 어떨까.
디지털산업부 유성호부장@전자신문, shyu@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단독LG CNS·이지스자산운용, 3조 투자 초대형 데이터센터 짓는다
-
2
이통3사, AI 기업 전환…글로벌 협업전략 가동
-
3
국회, 플랫폼 규제 입법 폭주…5개월 만에 16건 무더기 발의
-
4
'빈손 면담' 후 강공 나선 한동훈 “이재명 선고 전 김 여사 이슈 해소해야”
-
5
SK하이닉스, 3분기 영업이익 7조300억…“분기 사상 최대”
-
6
“컨설팅 받고 창업지원금 1억원 손쉽게”…브로커 다시 기승
-
7
SK하이닉스의 CXL
-
8
K잠수함, 폴란드發 잭팟 터지나
-
9
삼성, 갤럭시AI 지원 언어 20개로 확대
-
10
신기한 투명 마이크로 LED
브랜드 뉴스룸
×
![]()